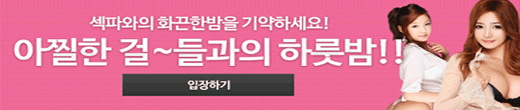괴인.
“아아아악--! 악--! 아악--!”
정화는 지금의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어쩌다 이렇게 되어 버린 것일까? 어쩌다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일까?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무엇을 잘못했던 것일까?
“사... 살려... 아아악--! 아... 아파... 아파...! 아악--!”
6년 만이었다. 13살 아직 어린 나이에 사문을 떠나 6년을 마교 총단에서 보내고 19살이 되어서야 비로소 돌아갈 수 있게 되었던 참이었다. 그녀가 나고 자란 아미산. 그 험하고 높은 준령이 눈에 아른거렸다. 그녀를 낳아준 어머니와 그녀를 가르쳐준 사부의 모습이 바로 눈앞에 잡힐 듯 보였다.
대파산을 넘을 때까지 그것은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곧 이루어질 현실에 대한 기대였다. 이제 곧 이루어지리라는 두근거림이었다. 그래서 웃었다. 험한 대파산을 넘으면서도 붉어진 얼굴로 웃을 수 있었다. 동행하던 사천에 터를 둔 문파의 여식들 또한 마찬가지 심정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되고 말았다. 꿈은 깨어지고 기대는 허물어졌다. 두근거리던 가슴은 절망이 되었고, 흥분으로 붉어진 얼굴은 창백하게 메말라 버리고 말았다. 웃음은 눈물이 되었다. 웃음은 마른 비명이 되었다.
“아... 아파... 엉엉... 아파... 아악... 아아아악--!”
이렇게 아플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사내와의 정사라는 것이 이렇게 아프기만 한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했다. 아프다. 너무 아프다. 수백의 사내를 겪었다. 그 사내들과 수천 수만의 정사를 치르었다. 여염의 여자라면 평생을 두고 감히 꿈조차 꾸지 못할 경험이다. 저자에서 몸을 파는 여자라 할지라도 이만한 일을 다 겪지는 못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렇게 아픈 적은 처음이다. 이렇게 아프고 또 아픈 경우는 처음이다.
언제였을까? 마교교주라는 늙은이에게 아직 어린 처녀를 꿰뚫리던 때도 이렇게까지 아프지는 않았던 것 같다. 마교교주의 은상이라고 장로라는 다른 늙은이에게 항문의 처녀를 꿰뚫리던 때도 이렇게까지 아프지는 않았었다. 하루에 열 명, 스무명을 상대할 때도, 한 번에 너댓명이 떼로 달려들어 그녀의 구멍을 팔 때도 이렇게 아프지는 않았다.
아니 오히려 즐거웠다. 그것을 즐겼다. 이미 배웠으니까. 마교로 출발하기 전에 사문에서 이미 정사를 즐기는 법을 배웠으니까. 그녀가 겪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을 겪었던 사부와 어머니로부터 어떻게 하면 정사를 즐길 수 있는가를 배웠으니까. 그래서 즐길 수 있었다. 정사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릴 수 있었다.
“으윽--! 윽--! 아악--! 아파... 엉엉엉... 엉... 아악--!”
아마도 너무 크기 때문일 것이다. 아마도 너무 거칠기 때문일 것이다. 처음이다. 이렇게 커다란 자지는. 보지를 찢을 듯 박혀드는 육중한 존재감은. 아니 아마도 찢어졌을 것이다. 이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은 아릿함은 보지의 여린 살이 찢겨진 증거일 것이다. 욱신거리는 아픔 와중에도 사내의 자지를 뛰노는 혈관의 움직임이 한껏 늘어난 여린 주름으로 그대로 전해질 정도다.
그 거대한 자지가 인정사정없이 파고들고 있다. 거세게 파고들었다가 거칠게 빠져나가고 있다. 오밀조밀한 주름이 자지에 쓸려 모양을 잃어간다. 그렇지 않아도 여린 살이다. 손대기조차 두려운 여리기만 한 살이다. 그것이 그 커다란 자지에 쓸리고 밀리고 눌려 짓이겨진다. 짓이겨 짓무른다. 짓무른 살이 피가 되어 흐른다.
그러나 사내는 그러한 사정 따위 봐주지 않는다. 피가 흐르든 말든, 살이 짓무르든 말든 그저 자신의 욕심을 채울 뿐이다. 더욱 거세게 허리를 움직이고 엉덩이를 올려붙여 자신의 욕심을 채울 뿐이다. 그 거대한 자지를 한껏 짓쳐 올려 보지가 찢어져라 밀어 넣을 뿐이다. 그리고 그때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른다. 아픔을 참지 못한 처절한 비명을.
“악--! 아아아악--! 악--!”
아니 이제는 차라리 비명조차 제대로 질러지지 않는다. 목이 쉬어 버린 때문이다. 힘이 빠져버린 때문이다. 도대체 며칠째인 것일까? 도대체 몇 번째인 것일까? 사흘? 나흘? 닷새? 여섯 번째일까? 여덟 번째일까? 사내가 잡아온 날고기를 네 번인가 먹었을 것이다. 그리고 기절만 열 번인가 했다. 덕분에 이제는 기절도 쉽지 않다. 슬픈 육체가 이미 고통에 길들여진 때문이다.
도대체 언제나 되어야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도대체 얼마나 더 비명을 질러대야 이 고통을 잊을 수 있을까? 흐릿한 의식 속으로 그녀가 보인다. 당혜옥. 당당하고 아름답던 아이. 언제나 자신감 넘치던 그래서 더욱 예쁘던 아이. 10년 내 사천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로 손색없는 그 아이가 구겨지듯 널브러져 있다. 얼룩처럼 번져 있는 검푸른 핏멍들. 하얀 둔덕 위에 검게 엉겨 있는 핏자욱. 처참하다. 처절하다. 눈물이 고인다. 눈앞이 흐릿하다.
“아악--!”
사내의 억센 손이 젖가슴을 움켜쥐며 그렇지 않아도 형편없이 찌그러져 있던 금고리가 살속으로 더욱 깊숙이 파고들며 화끈 뜨거운 열기를 자아낸다. 촉촉히 흐르는 것은 피일 것이다. 아직 다 마르지 않았는지 사내의 손이 움직일 때마다 흐르는 피. 젖가슴이 피에 젖어 끈적이며 사내의 가슴에 달라붙는다.
그나마 다행이다. 이제는 기절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피를 흘린다면 잠시나마 기절을 할 수 있을 듯하다. 당혜옥이 그런 것처럼. 중경오가의 오란의가 그런 것처럼. 처참하게 널브러진 다른 여자아이들처럼 기절로서 잠시나마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야 한다.
“아악--! 악--! 아아아악--!”
사내의 숨소리가 거칠다. 사내의 숨소리가 뜨겁다. 역한 비린내. 사내가 잡아왔던 날고기의 비린내일 것이다. 피와 살점이 입안에서 썩어 생기는 역겨운 비린내일 것이다. 누렇다 못해 붉은 이가 보인다. 아직 다 삭아버리지 않은 고깃점도. 그러나 그것도 이제는 아득한 너머로 사라져 버릴 것이다. 그녀는 이제 정신을 놓아버릴 테니까.
“으음... 으으음...”
낮은 신음소리가 들린다. 정현이다. 그녀의 사매. 그녀의 사촌. 같이 가양을 스승으로 삼고 있고, 전대 장문인 홍연의 두 딸이기도 한 당금 아미파 장문인인 진절과 장로 진양을 각각 친어머니로 두고 있는, 그래서 더 살갑고 가까운 이. 마교에서 6년의 시간을 지내는 동안 더 가까워졌다.
그런데 지금 그녀의 존재가 다시 정화에게 구원이 되고 있다. 이제 정화가 정신을 잃게 된다면,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 사내는 정화가 아닌 정현의 위에 있게 될 것이라는 안심 되어주고 있다. 그녀의 비명소리가 금방이라도 들릴 것 같지만 그래도 그녀가 있기에 당분간은 아프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편하다.
서서히 아픔도 사라져간다. 사내의 숨소리도 더이상 들리지 않는다. 역겨운 냄새도 나지 않는다. 그러고보니 눈앞도 흐리다. 사내가 있었던가? 눈앞에 사내가 있었던가? 보지 안이 아직은 아릿하다. 그러나 그조차도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아...!”
어느새 잠이 들었던 모양이다. 눈앞에 용이 보인다. 역시 꿈이다. 용이 자지 모양으로 보이는 것을 보니. 비늘 대신 우둘두둘 흉칙하게 솟은 핏줄을 보라. 용 머리 대신 달린 거북이 대가리와도 같이 생긴 것을 보라. 머리가 참 크다. 안에서 잘도 긁어주겠다. 목이 가늘고 몸이 굵은 것이 보지 안으로 들어오면 그 차오르는 느낌이 대단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려니 용이 그녀의 품안으로 들어온다. 그녀의 보지로.
기대했던대로 그것은 무척이나 굵고 단단하다. 그녀가 이제껏 느껴보았던 그 어떤 자지보다도 훌륭하다. 가득 차오르는 충일감. 동굴의 벽을 긁어주는 저릿함.
“아!”
짧은 단말마. 등줄기를 뻣뻣하게 만드는 한줄기 전기가 느껴진다. 절정이다. 절정을 느껴버린 것이다. 꿈인데. 그것도 자지 닮은 용이 들어오는 황당한 개꿈인데. 그 꿈속에서 절정을 느껴버린 것이다.
웃음이 난다. 왠지 웃음이 난다. 통쾌하게 웃어버리고 싶다. 이런 상화에서조차 절정을 느끼다니. 그런 그녀 자신이 스스로 우습다.
“선녀들...?”
용이 나왔으니 선녀가 나오는 것도 이상하지 않다. 서너명의 여자가 동굴 입구에 나타난다. 하얀 옷을 곱게 차려입은 아름다운 여자들. 정화 그녀보다도 두서너살은 어려 보인다.
그녀들이 나타나니 사내가 몸을 굳힌다. 사내가 아직 그녀의 위에 있었던가? 하긴 꿈이니 사내가 그녀의 위에 있든 없든 상관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꿈이라도 사내의 당황한 얼굴을 보고 있으니 기분은 좋다. 저 두려워하는 표정이라니. 선녀들의 매서운 눈빛을 보고 있으려니 문득 사내가 이대로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더 기분이 좋다.
아니나 다를까. 한 소리 큰 소리가 나는가 싶더니 하얗고 서늘한 빛이 허공을 가른다. 그것은 마치 칼과도 같다. 칼은 분명 아니지만 칼과 같이 허공을 가르고 사내를 때린다.
“아...!”
단 한 번이다. 단 한 번의 공격이다. 정화와 다른 7명의 여자들이 함께 힘을 합쳐 공격하고도 털끝 하나 다치지 못했던 사내가 단 한 번의 공격으로 뒤로 튕겨 날아간다. 피가 튄다. 사내의 입에서 뿜어진 피가 사내가 날아간 궤적을 허공에 그린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어느새 그 핏줄기를 따라 선녀들이 몸을 날려 따라붙는다. 다시 허공을 가르는 서늘한 빛. 손이다. 그녀들의 손이다. 너무도 하얀 손. 너무 하얘서 실재하는 지조차 의심스러운 손.
“소... 수...(素手)?”
거기서 의식은 끝이 난다. 무언가 소리가 더 들린 것도 같지만 무슨 소리인지 기억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한다. 아득한 어둠. 죽음만큼이나 포근하고 안락한 어둠이 그녀를 덮는다. 그제야 그녀는 안도의 숨을 내쉰다. 이제 아픔에서 벗어나 쉴 수 있다. 이제야 비로소.
“아아아악--! 악--! 아악--!”
정화는 지금의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어쩌다 이렇게 되어 버린 것일까? 어쩌다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일까?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무엇을 잘못했던 것일까?
“사... 살려... 아아악--! 아... 아파... 아파...! 아악--!”
6년 만이었다. 13살 아직 어린 나이에 사문을 떠나 6년을 마교 총단에서 보내고 19살이 되어서야 비로소 돌아갈 수 있게 되었던 참이었다. 그녀가 나고 자란 아미산. 그 험하고 높은 준령이 눈에 아른거렸다. 그녀를 낳아준 어머니와 그녀를 가르쳐준 사부의 모습이 바로 눈앞에 잡힐 듯 보였다.
대파산을 넘을 때까지 그것은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곧 이루어질 현실에 대한 기대였다. 이제 곧 이루어지리라는 두근거림이었다. 그래서 웃었다. 험한 대파산을 넘으면서도 붉어진 얼굴로 웃을 수 있었다. 동행하던 사천에 터를 둔 문파의 여식들 또한 마찬가지 심정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되고 말았다. 꿈은 깨어지고 기대는 허물어졌다. 두근거리던 가슴은 절망이 되었고, 흥분으로 붉어진 얼굴은 창백하게 메말라 버리고 말았다. 웃음은 눈물이 되었다. 웃음은 마른 비명이 되었다.
“아... 아파... 엉엉... 아파... 아악... 아아아악--!”
이렇게 아플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사내와의 정사라는 것이 이렇게 아프기만 한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했다. 아프다. 너무 아프다. 수백의 사내를 겪었다. 그 사내들과 수천 수만의 정사를 치르었다. 여염의 여자라면 평생을 두고 감히 꿈조차 꾸지 못할 경험이다. 저자에서 몸을 파는 여자라 할지라도 이만한 일을 다 겪지는 못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렇게 아픈 적은 처음이다. 이렇게 아프고 또 아픈 경우는 처음이다.
언제였을까? 마교교주라는 늙은이에게 아직 어린 처녀를 꿰뚫리던 때도 이렇게까지 아프지는 않았던 것 같다. 마교교주의 은상이라고 장로라는 다른 늙은이에게 항문의 처녀를 꿰뚫리던 때도 이렇게까지 아프지는 않았었다. 하루에 열 명, 스무명을 상대할 때도, 한 번에 너댓명이 떼로 달려들어 그녀의 구멍을 팔 때도 이렇게 아프지는 않았다.
아니 오히려 즐거웠다. 그것을 즐겼다. 이미 배웠으니까. 마교로 출발하기 전에 사문에서 이미 정사를 즐기는 법을 배웠으니까. 그녀가 겪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을 겪었던 사부와 어머니로부터 어떻게 하면 정사를 즐길 수 있는가를 배웠으니까. 그래서 즐길 수 있었다. 정사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릴 수 있었다.
“으윽--! 윽--! 아악--! 아파... 엉엉엉... 엉... 아악--!”
아마도 너무 크기 때문일 것이다. 아마도 너무 거칠기 때문일 것이다. 처음이다. 이렇게 커다란 자지는. 보지를 찢을 듯 박혀드는 육중한 존재감은. 아니 아마도 찢어졌을 것이다. 이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은 아릿함은 보지의 여린 살이 찢겨진 증거일 것이다. 욱신거리는 아픔 와중에도 사내의 자지를 뛰노는 혈관의 움직임이 한껏 늘어난 여린 주름으로 그대로 전해질 정도다.
그 거대한 자지가 인정사정없이 파고들고 있다. 거세게 파고들었다가 거칠게 빠져나가고 있다. 오밀조밀한 주름이 자지에 쓸려 모양을 잃어간다. 그렇지 않아도 여린 살이다. 손대기조차 두려운 여리기만 한 살이다. 그것이 그 커다란 자지에 쓸리고 밀리고 눌려 짓이겨진다. 짓이겨 짓무른다. 짓무른 살이 피가 되어 흐른다.
그러나 사내는 그러한 사정 따위 봐주지 않는다. 피가 흐르든 말든, 살이 짓무르든 말든 그저 자신의 욕심을 채울 뿐이다. 더욱 거세게 허리를 움직이고 엉덩이를 올려붙여 자신의 욕심을 채울 뿐이다. 그 거대한 자지를 한껏 짓쳐 올려 보지가 찢어져라 밀어 넣을 뿐이다. 그리고 그때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른다. 아픔을 참지 못한 처절한 비명을.
“악--! 아아아악--! 악--!”
아니 이제는 차라리 비명조차 제대로 질러지지 않는다. 목이 쉬어 버린 때문이다. 힘이 빠져버린 때문이다. 도대체 며칠째인 것일까? 도대체 몇 번째인 것일까? 사흘? 나흘? 닷새? 여섯 번째일까? 여덟 번째일까? 사내가 잡아온 날고기를 네 번인가 먹었을 것이다. 그리고 기절만 열 번인가 했다. 덕분에 이제는 기절도 쉽지 않다. 슬픈 육체가 이미 고통에 길들여진 때문이다.
도대체 언제나 되어야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도대체 얼마나 더 비명을 질러대야 이 고통을 잊을 수 있을까? 흐릿한 의식 속으로 그녀가 보인다. 당혜옥. 당당하고 아름답던 아이. 언제나 자신감 넘치던 그래서 더욱 예쁘던 아이. 10년 내 사천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로 손색없는 그 아이가 구겨지듯 널브러져 있다. 얼룩처럼 번져 있는 검푸른 핏멍들. 하얀 둔덕 위에 검게 엉겨 있는 핏자욱. 처참하다. 처절하다. 눈물이 고인다. 눈앞이 흐릿하다.
“아악--!”
사내의 억센 손이 젖가슴을 움켜쥐며 그렇지 않아도 형편없이 찌그러져 있던 금고리가 살속으로 더욱 깊숙이 파고들며 화끈 뜨거운 열기를 자아낸다. 촉촉히 흐르는 것은 피일 것이다. 아직 다 마르지 않았는지 사내의 손이 움직일 때마다 흐르는 피. 젖가슴이 피에 젖어 끈적이며 사내의 가슴에 달라붙는다.
그나마 다행이다. 이제는 기절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피를 흘린다면 잠시나마 기절을 할 수 있을 듯하다. 당혜옥이 그런 것처럼. 중경오가의 오란의가 그런 것처럼. 처참하게 널브러진 다른 여자아이들처럼 기절로서 잠시나마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야 한다.
“아악--! 악--! 아아아악--!”
사내의 숨소리가 거칠다. 사내의 숨소리가 뜨겁다. 역한 비린내. 사내가 잡아왔던 날고기의 비린내일 것이다. 피와 살점이 입안에서 썩어 생기는 역겨운 비린내일 것이다. 누렇다 못해 붉은 이가 보인다. 아직 다 삭아버리지 않은 고깃점도. 그러나 그것도 이제는 아득한 너머로 사라져 버릴 것이다. 그녀는 이제 정신을 놓아버릴 테니까.
“으음... 으으음...”
낮은 신음소리가 들린다. 정현이다. 그녀의 사매. 그녀의 사촌. 같이 가양을 스승으로 삼고 있고, 전대 장문인 홍연의 두 딸이기도 한 당금 아미파 장문인인 진절과 장로 진양을 각각 친어머니로 두고 있는, 그래서 더 살갑고 가까운 이. 마교에서 6년의 시간을 지내는 동안 더 가까워졌다.
그런데 지금 그녀의 존재가 다시 정화에게 구원이 되고 있다. 이제 정화가 정신을 잃게 된다면,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 사내는 정화가 아닌 정현의 위에 있게 될 것이라는 안심 되어주고 있다. 그녀의 비명소리가 금방이라도 들릴 것 같지만 그래도 그녀가 있기에 당분간은 아프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편하다.
서서히 아픔도 사라져간다. 사내의 숨소리도 더이상 들리지 않는다. 역겨운 냄새도 나지 않는다. 그러고보니 눈앞도 흐리다. 사내가 있었던가? 눈앞에 사내가 있었던가? 보지 안이 아직은 아릿하다. 그러나 그조차도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아...!”
어느새 잠이 들었던 모양이다. 눈앞에 용이 보인다. 역시 꿈이다. 용이 자지 모양으로 보이는 것을 보니. 비늘 대신 우둘두둘 흉칙하게 솟은 핏줄을 보라. 용 머리 대신 달린 거북이 대가리와도 같이 생긴 것을 보라. 머리가 참 크다. 안에서 잘도 긁어주겠다. 목이 가늘고 몸이 굵은 것이 보지 안으로 들어오면 그 차오르는 느낌이 대단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려니 용이 그녀의 품안으로 들어온다. 그녀의 보지로.
기대했던대로 그것은 무척이나 굵고 단단하다. 그녀가 이제껏 느껴보았던 그 어떤 자지보다도 훌륭하다. 가득 차오르는 충일감. 동굴의 벽을 긁어주는 저릿함.
“아!”
짧은 단말마. 등줄기를 뻣뻣하게 만드는 한줄기 전기가 느껴진다. 절정이다. 절정을 느껴버린 것이다. 꿈인데. 그것도 자지 닮은 용이 들어오는 황당한 개꿈인데. 그 꿈속에서 절정을 느껴버린 것이다.
웃음이 난다. 왠지 웃음이 난다. 통쾌하게 웃어버리고 싶다. 이런 상화에서조차 절정을 느끼다니. 그런 그녀 자신이 스스로 우습다.
“선녀들...?”
용이 나왔으니 선녀가 나오는 것도 이상하지 않다. 서너명의 여자가 동굴 입구에 나타난다. 하얀 옷을 곱게 차려입은 아름다운 여자들. 정화 그녀보다도 두서너살은 어려 보인다.
그녀들이 나타나니 사내가 몸을 굳힌다. 사내가 아직 그녀의 위에 있었던가? 하긴 꿈이니 사내가 그녀의 위에 있든 없든 상관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꿈이라도 사내의 당황한 얼굴을 보고 있으니 기분은 좋다. 저 두려워하는 표정이라니. 선녀들의 매서운 눈빛을 보고 있으려니 문득 사내가 이대로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더 기분이 좋다.
아니나 다를까. 한 소리 큰 소리가 나는가 싶더니 하얗고 서늘한 빛이 허공을 가른다. 그것은 마치 칼과도 같다. 칼은 분명 아니지만 칼과 같이 허공을 가르고 사내를 때린다.
“아...!”
단 한 번이다. 단 한 번의 공격이다. 정화와 다른 7명의 여자들이 함께 힘을 합쳐 공격하고도 털끝 하나 다치지 못했던 사내가 단 한 번의 공격으로 뒤로 튕겨 날아간다. 피가 튄다. 사내의 입에서 뿜어진 피가 사내가 날아간 궤적을 허공에 그린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어느새 그 핏줄기를 따라 선녀들이 몸을 날려 따라붙는다. 다시 허공을 가르는 서늘한 빛. 손이다. 그녀들의 손이다. 너무도 하얀 손. 너무 하얘서 실재하는 지조차 의심스러운 손.
“소... 수...(素手)?”
거기서 의식은 끝이 난다. 무언가 소리가 더 들린 것도 같지만 무슨 소리인지 기억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한다. 아득한 어둠. 죽음만큼이나 포근하고 안락한 어둠이 그녀를 덮는다. 그제야 그녀는 안도의 숨을 내쉰다. 이제 아픔에서 벗어나 쉴 수 있다. 이제야 비로소.

최고관리자
| 가입일 | 2016-08-11 | 접속일 | 2024-11-23 |
|---|---|---|---|
| 가입일 | 2016-08-11 | ||
| 접속일 | 2024-11-23 | ||
| 서명 | 황진이-19금 성인놀이터 | ||
| 태그 | |||
| 황진이-무료한국야동,일본야동,중국야동,성인야설,토렌트,성인야사,애니야동
야동토렌트, 국산야동토렌트, 성인토렌트, 한국야동, 중국야동토렌트, 19금토렌트 |
|||
추천 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