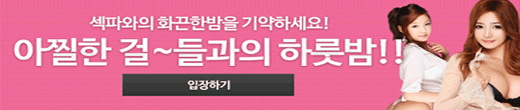영권이 눈을 떴을 때는 언젠가 한번쯤 상상해보았던 그대로 의자에 묶인 채였다.
입은 녹색의 테이프로 봉해져있었고 손은 의자 뒤로 꺾여서 무언가에 의해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다.
물론 다리도 녹색 테이프로 의자 다리에 꽁꽁 감겨있었고 몸통도 지나칠 정도로 많이 반복되어 테이프로 붙어 있었다.
영권은 좌우로 고개만 약간 돌릴 수 있었는데 곰곰히 생각해보지 않아도 거기가 어디인지를 알 수 있었다.
그곳은 전에 들른 적이 있는 동수의 자취방이었던 것이다.
그러고 보니 지난 밤에 동수와 술을 마시던 생각이 났다.
"그런데 왜 이런 짓을?"
영권은 거칠어진 파도처럼 밀려오는 황당무개함과 그로 인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온몸을 흔들어보았지만 제자리에서 뒤뚱거리기만 할 뿐 옴짝달싹할 수 없었다.
시간을 알 수 없는 어두침침함이 방안을 적시고 있었다.
대략 짐작에 새벽녁쯤 된 것 같았고 아무런 소리도 들려오고 있지 않았다.
방은 텅텅 빈 상태였다. 의자와 거기에 묶인 영권을 제외하면 아무 것도 없었다.
아니, 왼쪽으로 고개를 돌리자 방의 일부처럼 기원을 알 수 없이 매달려 있는 기다란 거울 하나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 안의 남자는 정말 처참한 모습으로 고정되어 있었다.
영권은 다시 한번 피가 끓는 것을 느끼며 온몸의 근육들을 쥐어짰다.
결과는 더 비참했는데 뒤뚱거리던 의자는, 영권은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져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유년시절에 의자를 뒤로 젖히고 건방지게 앉아있다가 삐끗해서 뒤로 넘어박히듯이, 그러나 그때와는 달리 자유롭지 못한 팔 다리때문에 모든 충격을 등뼈와 머리통으로 느껴야만 했다.
뒤통수를 바닥에 부딛힌 영권은 잠깐 동안의 몽롱함때문에 분노를 잊을 뻔했지만 금새 동수의 얼굴을 기억해냈고 다시 만나면 그를 지금의 자기와 똑같이 묶어놓고 늘씬하게 패줄 각오를 했다.
아침 운동을 해서인지 코가 시원해졌고 턱에 힘이 바짝 들어가 이를 갈고 싶어졌다.
부드득거리며 이를 갈고 있는데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고개를 들어 바라보려 했지만 몸에 가려 보이지가 않았다.
누군가 분명히 방안에 들어왔는데 조롱하듯이 모습을 보이지 않고 사각에 서있었다.
영권은 당연하게도 그게 동수라고 생각했고 허파에서 맴도는 고함을 지르며 경기를 하자 그가 다가와 영권을 내려다보았다.
눈이 마주치는 순간 영권의 눈에는 핏발이 터질듯이 부풀어올랐고 동수는 술에 취한 듯한 몽롱한 눈으로 응시하다가 영권의 어깨를 잡고 의자를, 영권을 일으켜 세웠다.
세워진 영권은 한 차례 길게 발악을 했지만 동수는 관심도 보이지 않았다.
"불쌍한 인간."
가끔씩 마주치는 동수의 눈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왜? 뭐가? 무슨 짓이야?"
영권은 그렇게 묻고 싶었지만, 간절한 울림이 닫힌 입안으로 흩어질 뿐 소리가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한동안 발작처럼 몸을 움찔거리던 영권은 억울함과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흐느낌은 그런대로 언어가 되어 우울하고 검은 방안을 울려댔다.
동수의 발이 눈에 들어왔다. 아니 그가 신고 있는 양말이 보였을 것이다.
그 녹색은 눈물에 번져 흐릿하게 눈속을 메웠고 새로운 의지를 충전한 영권은 고개를 들어 동수를 노려보았다.
동수는 영권의 입을 두르고 있는 조금은 젖어있고 느슨해진 테이프의 끝을 찾아 풀기 시작했다.
테이프에 붙은 머리카락들이 찌익 찌익 하는 소리를 내면서 함께 떨어졌고 마지막으로 입을 가로막고 있던 부분이 떨어지자 엄청한 욕설이 토물처럼 쏟아졌다.
"야! 이 개새끼야!"
철썩, 소리와 동시에 날아든 동수의 손바닥이 스위치를 잠그듯이 영권의 목소리를 멈추었다.
"시끄러워. 뭘 잘 했다고 큰 소리야?"
동수는 예전이나 어제와 같은 예의 바른 아르바이트생이 아니었다.
게다가 그의 목소리는 너무 차분해서 저 깊은 우물의 바닥에서 울리는 것과도 같은 음산함을 담고 있었다.
손바닥과 목소리에 놀란 영권은 쉽게 말을 잇지 못하고 더듬었다.
"도, 도, 도, 도대체 이, 이, 이게 무슨 짓이야?"
그러나 질문에 돌아온 것은 또 한번의 손바닥이었고 모욕이었으며 돌아버린 억지였다.
"무슨 짓이냐고? 도대체 넌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줄이나 알고 그러는 거야? 정신 못 차리지?"
분을 이기지 못했는지 급기야 동수는 이번에는 발바닥으로 영권의 가슴을 걷어찼다.
뒤로 일 미터쯤 밀려나면서 나동그라진 영권은 충격으로 힘든 숨을 몰아쉬었다.
영권은 눈도 뜨지 못한 상태에서 여전히 동수가 미친 이유가 궁금했지만 도저히 알 수는 없었다.
"그래. 내가 잘못했다고 치고 이유나 알고 맞자."
일으켜주지도 않는 동수에게 영권은 담배 연기가 찌든 것 처럼 누렇게 뜬 천장을 보며 말했다.
하지만 아무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다. 어떻게든 이 미친 시간을 벗어나야 할텐데 말이다.
영권은 다시 한번 그 이유를 물었다.
동수가 보이지도 않았지만 그의 귓구멍에 자신의 목소리가 박히고 있고 그래서 조금만 참으면 어떤 소리라도, 그게 대답이든 욕지거리든 입밖으로 기어나올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았다.
슬금슬금 기어나오는데 시간이 걸리기는 했지만 결국 동수는 입을 열었던 것이다.
"선화씨한테 그러면 어떡해?"
그래, 이제 이런 미친 짓거리를 하는 이유가 나오는구나.
그런데 선화씨라니, 내 마누라를 두고 하는 말이렸다. 그런데 선화씨라니, 사모님도 아니고 아주머니도 아니고 선화씨라니. 그건 너무 가깝거나 먼 표현이 아닐까. 그러나 영권은 기다렸다.
"어떻게 선화씨를 두고 다른 여자와 놀아날 수가 있냐고."
영권은 순간 동수가 자신의 전처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직감했고 다시 한번 선화가 원망스러웠다.
입은 녹색의 테이프로 봉해져있었고 손은 의자 뒤로 꺾여서 무언가에 의해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다.
물론 다리도 녹색 테이프로 의자 다리에 꽁꽁 감겨있었고 몸통도 지나칠 정도로 많이 반복되어 테이프로 붙어 있었다.
영권은 좌우로 고개만 약간 돌릴 수 있었는데 곰곰히 생각해보지 않아도 거기가 어디인지를 알 수 있었다.
그곳은 전에 들른 적이 있는 동수의 자취방이었던 것이다.
그러고 보니 지난 밤에 동수와 술을 마시던 생각이 났다.
"그런데 왜 이런 짓을?"
영권은 거칠어진 파도처럼 밀려오는 황당무개함과 그로 인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온몸을 흔들어보았지만 제자리에서 뒤뚱거리기만 할 뿐 옴짝달싹할 수 없었다.
시간을 알 수 없는 어두침침함이 방안을 적시고 있었다.
대략 짐작에 새벽녁쯤 된 것 같았고 아무런 소리도 들려오고 있지 않았다.
방은 텅텅 빈 상태였다. 의자와 거기에 묶인 영권을 제외하면 아무 것도 없었다.
아니, 왼쪽으로 고개를 돌리자 방의 일부처럼 기원을 알 수 없이 매달려 있는 기다란 거울 하나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 안의 남자는 정말 처참한 모습으로 고정되어 있었다.
영권은 다시 한번 피가 끓는 것을 느끼며 온몸의 근육들을 쥐어짰다.
결과는 더 비참했는데 뒤뚱거리던 의자는, 영권은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져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유년시절에 의자를 뒤로 젖히고 건방지게 앉아있다가 삐끗해서 뒤로 넘어박히듯이, 그러나 그때와는 달리 자유롭지 못한 팔 다리때문에 모든 충격을 등뼈와 머리통으로 느껴야만 했다.
뒤통수를 바닥에 부딛힌 영권은 잠깐 동안의 몽롱함때문에 분노를 잊을 뻔했지만 금새 동수의 얼굴을 기억해냈고 다시 만나면 그를 지금의 자기와 똑같이 묶어놓고 늘씬하게 패줄 각오를 했다.
아침 운동을 해서인지 코가 시원해졌고 턱에 힘이 바짝 들어가 이를 갈고 싶어졌다.
부드득거리며 이를 갈고 있는데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고개를 들어 바라보려 했지만 몸에 가려 보이지가 않았다.
누군가 분명히 방안에 들어왔는데 조롱하듯이 모습을 보이지 않고 사각에 서있었다.
영권은 당연하게도 그게 동수라고 생각했고 허파에서 맴도는 고함을 지르며 경기를 하자 그가 다가와 영권을 내려다보았다.
눈이 마주치는 순간 영권의 눈에는 핏발이 터질듯이 부풀어올랐고 동수는 술에 취한 듯한 몽롱한 눈으로 응시하다가 영권의 어깨를 잡고 의자를, 영권을 일으켜 세웠다.
세워진 영권은 한 차례 길게 발악을 했지만 동수는 관심도 보이지 않았다.
"불쌍한 인간."
가끔씩 마주치는 동수의 눈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왜? 뭐가? 무슨 짓이야?"
영권은 그렇게 묻고 싶었지만, 간절한 울림이 닫힌 입안으로 흩어질 뿐 소리가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한동안 발작처럼 몸을 움찔거리던 영권은 억울함과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흐느낌은 그런대로 언어가 되어 우울하고 검은 방안을 울려댔다.
동수의 발이 눈에 들어왔다. 아니 그가 신고 있는 양말이 보였을 것이다.
그 녹색은 눈물에 번져 흐릿하게 눈속을 메웠고 새로운 의지를 충전한 영권은 고개를 들어 동수를 노려보았다.
동수는 영권의 입을 두르고 있는 조금은 젖어있고 느슨해진 테이프의 끝을 찾아 풀기 시작했다.
테이프에 붙은 머리카락들이 찌익 찌익 하는 소리를 내면서 함께 떨어졌고 마지막으로 입을 가로막고 있던 부분이 떨어지자 엄청한 욕설이 토물처럼 쏟아졌다.
"야! 이 개새끼야!"
철썩, 소리와 동시에 날아든 동수의 손바닥이 스위치를 잠그듯이 영권의 목소리를 멈추었다.
"시끄러워. 뭘 잘 했다고 큰 소리야?"
동수는 예전이나 어제와 같은 예의 바른 아르바이트생이 아니었다.
게다가 그의 목소리는 너무 차분해서 저 깊은 우물의 바닥에서 울리는 것과도 같은 음산함을 담고 있었다.
손바닥과 목소리에 놀란 영권은 쉽게 말을 잇지 못하고 더듬었다.
"도, 도, 도, 도대체 이, 이, 이게 무슨 짓이야?"
그러나 질문에 돌아온 것은 또 한번의 손바닥이었고 모욕이었으며 돌아버린 억지였다.
"무슨 짓이냐고? 도대체 넌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줄이나 알고 그러는 거야? 정신 못 차리지?"
분을 이기지 못했는지 급기야 동수는 이번에는 발바닥으로 영권의 가슴을 걷어찼다.
뒤로 일 미터쯤 밀려나면서 나동그라진 영권은 충격으로 힘든 숨을 몰아쉬었다.
영권은 눈도 뜨지 못한 상태에서 여전히 동수가 미친 이유가 궁금했지만 도저히 알 수는 없었다.
"그래. 내가 잘못했다고 치고 이유나 알고 맞자."
일으켜주지도 않는 동수에게 영권은 담배 연기가 찌든 것 처럼 누렇게 뜬 천장을 보며 말했다.
하지만 아무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다. 어떻게든 이 미친 시간을 벗어나야 할텐데 말이다.
영권은 다시 한번 그 이유를 물었다.
동수가 보이지도 않았지만 그의 귓구멍에 자신의 목소리가 박히고 있고 그래서 조금만 참으면 어떤 소리라도, 그게 대답이든 욕지거리든 입밖으로 기어나올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았다.
슬금슬금 기어나오는데 시간이 걸리기는 했지만 결국 동수는 입을 열었던 것이다.
"선화씨한테 그러면 어떡해?"
그래, 이제 이런 미친 짓거리를 하는 이유가 나오는구나.
그런데 선화씨라니, 내 마누라를 두고 하는 말이렸다. 그런데 선화씨라니, 사모님도 아니고 아주머니도 아니고 선화씨라니. 그건 너무 가깝거나 먼 표현이 아닐까. 그러나 영권은 기다렸다.
"어떻게 선화씨를 두고 다른 여자와 놀아날 수가 있냐고."
영권은 순간 동수가 자신의 전처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직감했고 다시 한번 선화가 원망스러웠다.

최고관리자
| 가입일 | 2016-08-11 | 접속일 | 2024-11-23 |
|---|---|---|---|
| 가입일 | 2016-08-11 | ||
| 접속일 | 2024-11-23 | ||
| 서명 | 황진이-19금 성인놀이터 | ||
| 태그 | |||
| 황진이-무료한국야동,일본야동,중국야동,성인야설,토렌트,성인야사,애니야동
야동토렌트, 국산야동토렌트, 성인토렌트, 한국야동, 중국야동토렌트, 19금토렌트 |
|||
추천 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