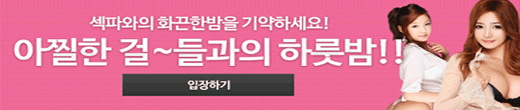자다가 빗소리에 깨어 잠시 끄적여 시작한 경험담 혹은 소설입니다.
분류를 뭘로 할까 한참 고민했습니다.
온니 경험담이라고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해서요,
기억은 미화되고 또 미화된 기억이 글로 남을 때에는
더해지고 더해짐이 있기 마련이니까요,
제가 그 친구에 대한 좋은 기억으로 가지고 글로 옮기고 싶어 하는 것처럼,
그 친구도 같은 마음이기를 바라봅니다.
부족하고 부족한 글을 읽어주시고자 시간 내어 주시는 분들 모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즐거운 밤 되세요.
(쓰던 소설은 첫 소설이고 또 정말 상상력에 의존해야 하다 보니
도저히 진도가 안 나갑니다. 그래서 주제에 두 편을 쓰는 점 이해해 주세요.
기다리시는 분은 없겠지만 천천히 주말까지 써 보렵니다.)
----------------------------------------------------------------------------------
[ 누나가 남자로 만들어 줄게! - 1부 ]
23살 어느 초겨울 날로 기억한다.
정말 피곤한 날이었다.
사회경험을 해 보고 싶다는 핑계로 휴학계를 냈지만,
그 가을 그리고 겨울 인턴 경험은 정말 끔찍했다.
채용 공고에 나와 있는 업무와는 전혀 다른,
온종일 전화를 받고 서류를 나르고 복사하고 탕비실을 점검하며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 상처받는 얼굴을 숨긴 채 헤헤거리는,
정말 "인턴"다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물론, 몇 개월의 인턴 생활 따위, 지금 몇 년차의 직장인이 되어 구르고 구르다 보니
시키는 것만 하는 그때는 천국이었구나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정말 사회생활이 이런 거라면 차라리 어린 나이를 무기 삼아 일명 "취집"을 해야 하나,
우스운 고민을 심각하게 할 정도로 난 찌들어 있었던 것 같다.
"나 먼저 가야 할 것 같아. "
"지지배, 뭐야 벌써..."
"정말 너무너무너무 너~무 피곤하단 말야.. 흑"
"그래도 불금인데? 진짜 니가 지금 이 시간에 들어가겠다고?"
"하아 불금... 그게 뭐야.... 먹는 거야? 불타는 금요일 따윈 잊어버린 지 오래다!"
노는 것 하면 정말 빠지지 않는 나였지만,
그날은 짧은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도
웃음없는 농담으로 일어날 정말 지쳐 있었다.
버스에서 내려 터덜터덜 혼자 사는 작은 원룸 건물이 보이는 골목길에 다다르니,
한층 차가워진 밤 공기가 상쾌하게 얼굴을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 느껴졌다.
내 집이 보이는 그 골목이었기 때문에 나도 모를 안정감이 들어서였을까?
같은 바람인데도 나를 위로해 주는 듯한 상쾌한 기분이었다.
술기운에 하늘을 바라보니 별이 떠 있는 그 하늘도 참 좋았다.
내가 마지막으로 언제 하늘을 봤나 하는 오글거리는 생각도 들었던 것 보니
한 두잔 쉴 틈 없이 입으로 밀어 넣었던 술기운이 슬쩍 올라 있었던 것 같다.
그저 좁은 나의 방에는 들어가기 싫다는 생각이 들었다.
서늘하게 불어오는 그날의 바람이
시나브로 쌓여가던 스트레스 역시 같이 쓸어 주는 것 같아 참 좋았다.
"바람도 좋은데 잠깐 앉아 있을까? 어차피 반겨주는 사람도 없는데..."
현관 앞에서 잠시 고민하다가 그냥 털썩 원룸 빌라 앞 계단에 엉덩이를 대고
팔을 모으고 고개를 숙여 쪼그려 앉았다.
엉덩이에 닿는 차가운 느낌에 몸이 움찔했지만 그것도 이내 편안하게 느껴졌다.
얼마나 그렇게 앉아있었던 것일까,
좋게 느껴지던 바람이 조금은 쌀쌀하게 느껴질 무렵이었다.
사람의 발걸음 소리가 귓가에 들려오다가 내 근처에서 멈추더니.
살그머니 소리를 줄이고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느껴졌다,
사실 겁이 났을만한 상황이었는데 이것이 여자의 감이라는 것일까?
그때의 나는 왠지 그 상황이 오히려 기대되는 기분이었다.
차피 이 골목은 좁고 주택이 많아서 무슨 일이 있을 경우 내가 소리를 지르면
누구든 나와 주겠지 하는 말 그대로 근자감도 있었고,
조금 솔직해지자면 정말 무료하고 지쳐있는 나였기에
뭔가 이슈가 생기기를 바라는 무모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다.
혹시 미친년으로 알거나 술에 취한 줄 안다면 그런척해 줘야지 하는 재미있는 생각도 들었다.
걱정 아니, 기대와는 다르게 숨죽여 나에게 다가온 그것은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고 있었다.
내 앞에 있는 것은 확실한데, 난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쪼그려 앉은 그 자세 그대로였고
또 그 사람을 놀려 켜 주고 싶은 마음은 없었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자는 척을 하는 상황이었다.
그대로 수 분이 지나고 나도 얼음, 그리고 나의 앞에 서 있는 그도 얼음인 우스운 정적을 깬 건
내 옆으로 다가와 앉는 그의 움직임이었다.
쪼그려 앉은 나의 옆에 그도 조심스럽게 앉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는 천천히 나의 어깨에 팔을 둘렀다.
아니 내 어깨에 그 무게가 느껴지지 않았던 것을 떠올려보면
팔을 둘렀다기보다 어깨에 팔을 대고 있었던 것 같다.
사실 그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마음이 컸다.
재미보다도, 그리고 두려움보다도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눈을 뜨고 누구냐고 물어보기에도 뻘쭘하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자니
혹시 내 지갑이라도, 휴대폰이라도 가지고 도망을 가면 어쩌나 하는 겁도 났다.
그러던 순간, 내 어깨를 감싸고 있던 -분명 떨리고 있던,- 그의 손이
매우 조심스럽지만 어설프게 내 겨드랑이 사이로 들어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겨드랑이 사이로 들어온 그의 손은 나의 브래지어 위에 와 닿았고
만지는 것도 주무르는 것도 아닌 그저 손만 대고 꿈쩍하지 않는 그의 움직임에
그리고 부들부들 떨고 있던 오히려 내가 더욱 당황했다.
이런 상황을 바랐던 것은 아니였다.
사실 모르는 남자와의 짜릿한 섹스를 꿈꾸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었겠지만,
그때 느끼는 그 기분은 그런 짜릿함과는 거리가 있었다.
성추행 인건가? 성추행. 그래 이건 성추행이다!
근데 이거 너무 어설픈 것 아닌가,
브래지어 넘어 나의 가슴에까지 와 닿는 그의 손 떨림에 정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에라 모르겠다 하는 마음에 고개를 들고 눈을 떠서 그를 쳐다봤다.
.....음?..
나의 움직임에 정말 귀신이라도 본 듯 손을 재빨리 거두고는
도망도 못 가고 그 자리에 얼음처럼 굳어버린 그 아이.
맞다. "그"라고 하기보다는 "그 아이"라고 해야 어울릴만한
덩치는 컸지만 얼굴에 솜털과 함께 군데군데 여드름이 보일 만큼 어린 티가 나는
"나 학생이에요" 하는 백팩을 매고,
당시 어린 애들 사이에서 -물론 나도 어렸지만 내 나이 또래보다 더 아래에서-
유행하는 노란 디키즈 꿀벌티를 입은,
그 아이가 나의 얼굴을 보며 꼭 가슴에 올렸던 손만큼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야... 너 뭐해..?"
"아..아.아니요 그게 아니고... 저. 혹시 아프신..거 아닌가... 해서"
"뭐?"
"그게.. 아... 정말 죄송합니다..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화를 내려고 했었다. 사실 나도 무서운 마음이 들지 않았던 것은 아니였으니까,
날 두렵게 한 죄, 내 가슴을 만진 죄 경찰서라도 끌고 가야 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으로
눈을 떴고 사납게 노려보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가만히 있었던 나도 우스웠고, 날 두렵게 했던 것이 솜털 보송한 아이였다는 게 우스웠고
눈도 못 처다보고 죄송합니다만 하고 있는 그 아이의 모습이 제일 우스웠다.
술기운 때문이었을까? 밤 공기 때문이었을까?
분명 화를 내야 하는 상황인데도 우습고 또 우스웠다.
나는 풉, 하는 작은 웃음이 터졌지만 억지로 화를 내는 듯한 말투로
당황해 하는 그 아이를 보며 말을 이었다.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저.. 그게.. 그러니까.. 죄..죄송합니다"
"뭐가 미안한데? 내 가슴 만진 거?"
"...아... 그게...."
목소리에서도 그가 얼마나 쫄아있는지
자기가 만든 상황이면서도 얼마나 떨고 있는지 그대로 느껴지는 것 같았다.
"너 몇 살이야?"
"..네..네??? "
"몇 살이냐고, "
"저... 지금은 .....19살인데요.. "
"19살이면... 고3? 그럼 내가 누나니까 말 놓는 거 괜찮지"
"네..네.."
"너 이 자식아! 이렇게 함부로 여자 만지고 다니면 조만간 경찰 아저씨 만나는 거야!"
"그게..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죄송해요.."
"됐어 인마, 다신 이런 짓 하고 돌아다니지 마라~"
"네.. 죄송합니다."
그의 끝없는 죄송하다는 말을 들으며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그 아이도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엉거주춤 서 있었다.
그렇게 엉거주춤 서 있는 모습을 보니 또 웃음이 났다.
웃는 나를 보며 조금은 안심을 한 듯 굳었던 그 아이의 얼굴도 조금은 풀어지는 것 같았다.
"늦었는데 빨리 들어가"
"..네..네! "
먼저 집으로 향하는 계단을 오르니 그 아이도 나에게 고개를 숙이며
골목 반대편으로 슬그머니 발걸음을 옮기는 모습이 보였다.
아이의 뒷모습을 보며 갑자기 이 상황이 너무 재미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 아이를 그냥 보낸다면 또다시 무료한 밤이 될 것 같았다.
그렇다고 저 아이를 잡고 뭘 할 것인가. 뭘 해야 하는 건가,
아니 꼭 뭘 해야 하나?
그냥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싶고, 재미있고 싶었다.
무엇보다 이 밤 이대로 혼자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다.
"야 너,"
"네..??"
"지금 바빠?"
"아니요.. 안..바쁜데요.."
"그럼 너, 술 먹어본 적 있어?"
"수..술이요? 네 친구들하고.. 먹어본 적은 있는데.."
"어린놈이 까져가지고, 음... 그럼 말야 지금 시간 괜찮으면 누나랑 맥주 한잔 할래?"
분류를 뭘로 할까 한참 고민했습니다.
온니 경험담이라고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해서요,
기억은 미화되고 또 미화된 기억이 글로 남을 때에는
더해지고 더해짐이 있기 마련이니까요,
제가 그 친구에 대한 좋은 기억으로 가지고 글로 옮기고 싶어 하는 것처럼,
그 친구도 같은 마음이기를 바라봅니다.
부족하고 부족한 글을 읽어주시고자 시간 내어 주시는 분들 모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즐거운 밤 되세요.
(쓰던 소설은 첫 소설이고 또 정말 상상력에 의존해야 하다 보니
도저히 진도가 안 나갑니다. 그래서 주제에 두 편을 쓰는 점 이해해 주세요.
기다리시는 분은 없겠지만 천천히 주말까지 써 보렵니다.)
----------------------------------------------------------------------------------
[ 누나가 남자로 만들어 줄게! - 1부 ]
23살 어느 초겨울 날로 기억한다.
정말 피곤한 날이었다.
사회경험을 해 보고 싶다는 핑계로 휴학계를 냈지만,
그 가을 그리고 겨울 인턴 경험은 정말 끔찍했다.
채용 공고에 나와 있는 업무와는 전혀 다른,
온종일 전화를 받고 서류를 나르고 복사하고 탕비실을 점검하며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 상처받는 얼굴을 숨긴 채 헤헤거리는,
정말 "인턴"다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물론, 몇 개월의 인턴 생활 따위, 지금 몇 년차의 직장인이 되어 구르고 구르다 보니
시키는 것만 하는 그때는 천국이었구나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정말 사회생활이 이런 거라면 차라리 어린 나이를 무기 삼아 일명 "취집"을 해야 하나,
우스운 고민을 심각하게 할 정도로 난 찌들어 있었던 것 같다.
"나 먼저 가야 할 것 같아. "
"지지배, 뭐야 벌써..."
"정말 너무너무너무 너~무 피곤하단 말야.. 흑"
"그래도 불금인데? 진짜 니가 지금 이 시간에 들어가겠다고?"
"하아 불금... 그게 뭐야.... 먹는 거야? 불타는 금요일 따윈 잊어버린 지 오래다!"
노는 것 하면 정말 빠지지 않는 나였지만,
그날은 짧은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도
웃음없는 농담으로 일어날 정말 지쳐 있었다.
버스에서 내려 터덜터덜 혼자 사는 작은 원룸 건물이 보이는 골목길에 다다르니,
한층 차가워진 밤 공기가 상쾌하게 얼굴을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 느껴졌다.
내 집이 보이는 그 골목이었기 때문에 나도 모를 안정감이 들어서였을까?
같은 바람인데도 나를 위로해 주는 듯한 상쾌한 기분이었다.
술기운에 하늘을 바라보니 별이 떠 있는 그 하늘도 참 좋았다.
내가 마지막으로 언제 하늘을 봤나 하는 오글거리는 생각도 들었던 것 보니
한 두잔 쉴 틈 없이 입으로 밀어 넣었던 술기운이 슬쩍 올라 있었던 것 같다.
그저 좁은 나의 방에는 들어가기 싫다는 생각이 들었다.
서늘하게 불어오는 그날의 바람이
시나브로 쌓여가던 스트레스 역시 같이 쓸어 주는 것 같아 참 좋았다.
"바람도 좋은데 잠깐 앉아 있을까? 어차피 반겨주는 사람도 없는데..."
현관 앞에서 잠시 고민하다가 그냥 털썩 원룸 빌라 앞 계단에 엉덩이를 대고
팔을 모으고 고개를 숙여 쪼그려 앉았다.
엉덩이에 닿는 차가운 느낌에 몸이 움찔했지만 그것도 이내 편안하게 느껴졌다.
얼마나 그렇게 앉아있었던 것일까,
좋게 느껴지던 바람이 조금은 쌀쌀하게 느껴질 무렵이었다.
사람의 발걸음 소리가 귓가에 들려오다가 내 근처에서 멈추더니.
살그머니 소리를 줄이고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느껴졌다,
사실 겁이 났을만한 상황이었는데 이것이 여자의 감이라는 것일까?
그때의 나는 왠지 그 상황이 오히려 기대되는 기분이었다.
차피 이 골목은 좁고 주택이 많아서 무슨 일이 있을 경우 내가 소리를 지르면
누구든 나와 주겠지 하는 말 그대로 근자감도 있었고,
조금 솔직해지자면 정말 무료하고 지쳐있는 나였기에
뭔가 이슈가 생기기를 바라는 무모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다.
혹시 미친년으로 알거나 술에 취한 줄 안다면 그런척해 줘야지 하는 재미있는 생각도 들었다.
걱정 아니, 기대와는 다르게 숨죽여 나에게 다가온 그것은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고 있었다.
내 앞에 있는 것은 확실한데, 난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쪼그려 앉은 그 자세 그대로였고
또 그 사람을 놀려 켜 주고 싶은 마음은 없었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자는 척을 하는 상황이었다.
그대로 수 분이 지나고 나도 얼음, 그리고 나의 앞에 서 있는 그도 얼음인 우스운 정적을 깬 건
내 옆으로 다가와 앉는 그의 움직임이었다.
쪼그려 앉은 나의 옆에 그도 조심스럽게 앉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는 천천히 나의 어깨에 팔을 둘렀다.
아니 내 어깨에 그 무게가 느껴지지 않았던 것을 떠올려보면
팔을 둘렀다기보다 어깨에 팔을 대고 있었던 것 같다.
사실 그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마음이 컸다.
재미보다도, 그리고 두려움보다도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눈을 뜨고 누구냐고 물어보기에도 뻘쭘하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자니
혹시 내 지갑이라도, 휴대폰이라도 가지고 도망을 가면 어쩌나 하는 겁도 났다.
그러던 순간, 내 어깨를 감싸고 있던 -분명 떨리고 있던,- 그의 손이
매우 조심스럽지만 어설프게 내 겨드랑이 사이로 들어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겨드랑이 사이로 들어온 그의 손은 나의 브래지어 위에 와 닿았고
만지는 것도 주무르는 것도 아닌 그저 손만 대고 꿈쩍하지 않는 그의 움직임에
그리고 부들부들 떨고 있던 오히려 내가 더욱 당황했다.
이런 상황을 바랐던 것은 아니였다.
사실 모르는 남자와의 짜릿한 섹스를 꿈꾸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었겠지만,
그때 느끼는 그 기분은 그런 짜릿함과는 거리가 있었다.
성추행 인건가? 성추행. 그래 이건 성추행이다!
근데 이거 너무 어설픈 것 아닌가,
브래지어 넘어 나의 가슴에까지 와 닿는 그의 손 떨림에 정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에라 모르겠다 하는 마음에 고개를 들고 눈을 떠서 그를 쳐다봤다.
.....음?..
나의 움직임에 정말 귀신이라도 본 듯 손을 재빨리 거두고는
도망도 못 가고 그 자리에 얼음처럼 굳어버린 그 아이.
맞다. "그"라고 하기보다는 "그 아이"라고 해야 어울릴만한
덩치는 컸지만 얼굴에 솜털과 함께 군데군데 여드름이 보일 만큼 어린 티가 나는
"나 학생이에요" 하는 백팩을 매고,
당시 어린 애들 사이에서 -물론 나도 어렸지만 내 나이 또래보다 더 아래에서-
유행하는 노란 디키즈 꿀벌티를 입은,
그 아이가 나의 얼굴을 보며 꼭 가슴에 올렸던 손만큼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야... 너 뭐해..?"
"아..아.아니요 그게 아니고... 저. 혹시 아프신..거 아닌가... 해서"
"뭐?"
"그게.. 아... 정말 죄송합니다..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화를 내려고 했었다. 사실 나도 무서운 마음이 들지 않았던 것은 아니였으니까,
날 두렵게 한 죄, 내 가슴을 만진 죄 경찰서라도 끌고 가야 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으로
눈을 떴고 사납게 노려보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가만히 있었던 나도 우스웠고, 날 두렵게 했던 것이 솜털 보송한 아이였다는 게 우스웠고
눈도 못 처다보고 죄송합니다만 하고 있는 그 아이의 모습이 제일 우스웠다.
술기운 때문이었을까? 밤 공기 때문이었을까?
분명 화를 내야 하는 상황인데도 우습고 또 우스웠다.
나는 풉, 하는 작은 웃음이 터졌지만 억지로 화를 내는 듯한 말투로
당황해 하는 그 아이를 보며 말을 이었다.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저.. 그게.. 그러니까.. 죄..죄송합니다"
"뭐가 미안한데? 내 가슴 만진 거?"
"...아... 그게...."
목소리에서도 그가 얼마나 쫄아있는지
자기가 만든 상황이면서도 얼마나 떨고 있는지 그대로 느껴지는 것 같았다.
"너 몇 살이야?"
"..네..네??? "
"몇 살이냐고, "
"저... 지금은 .....19살인데요.. "
"19살이면... 고3? 그럼 내가 누나니까 말 놓는 거 괜찮지"
"네..네.."
"너 이 자식아! 이렇게 함부로 여자 만지고 다니면 조만간 경찰 아저씨 만나는 거야!"
"그게..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죄송해요.."
"됐어 인마, 다신 이런 짓 하고 돌아다니지 마라~"
"네.. 죄송합니다."
그의 끝없는 죄송하다는 말을 들으며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그 아이도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엉거주춤 서 있었다.
그렇게 엉거주춤 서 있는 모습을 보니 또 웃음이 났다.
웃는 나를 보며 조금은 안심을 한 듯 굳었던 그 아이의 얼굴도 조금은 풀어지는 것 같았다.
"늦었는데 빨리 들어가"
"..네..네! "
먼저 집으로 향하는 계단을 오르니 그 아이도 나에게 고개를 숙이며
골목 반대편으로 슬그머니 발걸음을 옮기는 모습이 보였다.
아이의 뒷모습을 보며 갑자기 이 상황이 너무 재미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 아이를 그냥 보낸다면 또다시 무료한 밤이 될 것 같았다.
그렇다고 저 아이를 잡고 뭘 할 것인가. 뭘 해야 하는 건가,
아니 꼭 뭘 해야 하나?
그냥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싶고, 재미있고 싶었다.
무엇보다 이 밤 이대로 혼자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다.
"야 너,"
"네..??"
"지금 바빠?"
"아니요.. 안..바쁜데요.."
"그럼 너, 술 먹어본 적 있어?"
"수..술이요? 네 친구들하고.. 먹어본 적은 있는데.."
"어린놈이 까져가지고, 음... 그럼 말야 지금 시간 괜찮으면 누나랑 맥주 한잔 할래?"

최고관리자
| 가입일 | 2016-08-11 | 접속일 | 2024-11-23 |
|---|---|---|---|
| 가입일 | 2016-08-11 | ||
| 접속일 | 2024-11-23 | ||
| 서명 | 황진이-19금 성인놀이터 | ||
| 태그 | |||
| 황진이-무료한국야동,일본야동,중국야동,성인야설,토렌트,성인야사,애니야동
야동토렌트, 국산야동토렌트, 성인토렌트, 한국야동, 중국야동토렌트, 19금토렌트 |
|||
추천 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