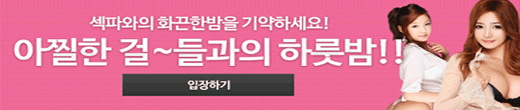다이어리를 펴고 4월 3일의 네모안에 빨간 볼펜으로 52이라는 숫자와 허리띠라는 단어를 적었다.
숫자는 나를 거쳐간 남자들의 수이고 허리띠라는 단어는 그 남자를 기억하기 위해 적어놓은 것이다. 어느 때는 남자가 사는 도시를 적어놓기도 하고 직업을 적어놓기도 했다. 도시나 직업을 적어놓았을 때는 그들에 대해서 선명하게 떠오르는 이미지가 없을 때였다.
어느 날에는 <19, A>라고 적혀있기도 하다. A라는 것이 처음으로 내 애널이 뚫린 것을 의미했다.
물론 같은 사람과의 두번째 만남부터는 기록하지 않았다. 그건 나에게 아무 의미없는 반복일 뿐이었다.
그렇게 나의 다이어리는 알 수 없는 암호같은 글들로 채워져갔다.
다이어리를 앞으로 넘겨보았다.
3월에도, 2월에도 빨간 글씨가 없었다. 1월의 다이어리.. 24일의 그곳에는 선명하고 굵게 49, 50, 51라고만 적혀있었다. 어떤 기억할 단어도 적혀 있지 않았지만 나는 이 숫자들만으로도 그 날을 또렷히 기억해 낼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2월과 3월에 아무도 만나려고 하지 않았던 이유이기도 했다.
또 다시 악몽이 지속되던 1월의 어느 날, 나는 채팅사이트를 찾았다.
<술 한잔 하실 분>
그가 만든 대화방은 이랬던 것으로 기억된다.
술은 사람을 흥분시키기도 하지만, 또 헤어나올 수 없는 늪처럼 아래로 아래로 빨아들이기도 한다. 술을 한잔하고 쿨한척 원나잇을 하는 건 가장 쉽게 나를 제물로 바치는 방법이기도 했다.
무엇보다 술을 같이 마신다는 건 만남이 전제되어 있었고, 굳이 꽃뱀으로 오해받으며 상대를 유혹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었다.
그는 28살 직장인이라고 소개를 했고 나는 23살 대학생라고 소개했다.
지금 만나자는 그의 제안에 오늘은 너무 늦었다고 내일 보자고 했다. 밤 9시면 그리 늦은 시간은 아니었지만 그가 사는 곳으로 가려면 1시간 정도 시간이 필요했고, 술을 마시고, 가랭이를 벌리고, 돌아오는 시간까지 생각하면 오늘은 무리였다.
나도 오늘 지금 바로 만나고 싶었다. 괴물과 또 하루밤을 같이 보내야한다는 건 너무 힘든 일이었다.
터미널 근처에 산다고 말했다. 나는 늘 역 아니면 터미널 근처에 사는 여자였다.
그는 터미널 앞으로 약속시간에 맞춰 나를 데리러 오겠다고 했다. 나는 그의 핸드폰 번호를 묻고 나의 핸드폰 번호는 알려주지 않았다.
그도 나의 이런 비밀스러운 숨김속에서 내일의 만남이 질퍽해질거라고 짐작을 했을 것이다.
오늘은 어린 학생같아 보여야했다. 청바지에 목까지 올라오는 분홍색 스웨트를 입고 페딩을 걸쳤다.
이젠 친숙해져버린 고속 터미널에서 그에게로 가는 버스를 탔다. 차가운 바깥의 바람과는 달리 버스안의 따뜻한 히터바람은 나를 곧 잠들게 했고 눈을 떴을 땐 이미 그가 사는 곳에 도착해 있었다.
공중전화를 찾아 그에게 전화를 했다.
[여보세요?]
[저에요..]
[정말 왔어? 지금 어디야?]
약간 놀란듯한 말투였다. 약속은 했지만 큰 기대는 하지 않았던 것 같았다. 나는 터미널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했고 그는 이제 막 마치고 나가는 길이라며 20분 정도 걸릴거라고 했다.
공중전화 수화기를 내려놓고 시계를 봤다. 이미 약속시간이 5분이나 지난 상태였다.
나는 먼 길을 달려왔고, 약속시간을 30분이나 지나서 나타날 낮선 남자에게 가랭이를 벌리려고 찬 바람을 맞으면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물론 핑계는 술이었지만...
나는 왜 이런 비참함을 느낄 때 젖어드는 것일까? 알 수 없었다.
"민아씨?"
내 앞에 멈춰선 흰색 아반떼의 유리창이 내려가더니 말끔하게 생긴 한 남자가 나에게 말을 걸었다.
"...네"
그 남자에게 내 이름을 민아라고 말했던 모양이다. 물론 내 이름은 민아가 아니다.
그 남자의 차에 올라탔을 때 그는 "예쁘네"라는 말로 대화를 시작했다. 아마 채팅에서 술먹겠다고 나오는 여자는 못 생겼을거라 생각했던 모양이었다. 차안의 조그마한 시계는 42분을 가르키고 있었다.
차를 타고 가는 동안 그는 어느 학교를 다니는지, 전공이 뭔지, 졸업하고 뭐 할건지에 대해서 물어봤다. 학교 이름은 말하지 않았다. 근처 대학의 영문학과를 다닌다고만 했고, 졸업반이며 졸업하고는 아빠 무역회사에서 일할거라고 했다. 실제로는 아빠는 공무원이었다.
"맥주? 소주?"
그가 물었다. 따끈한 탕이 먹고 싶다고 했고, 우리는 일본식 오뎅집에 들어가 구석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소주와 오뎅탕을 시켰다.
그는 쾌활해보였고 여러가지 농담을 던지며 나를 즐겁게 해주려고 했다. 나도 살짝 웃어주며 맞장구를 쳐줬다.
그 때, 그의 핸드폰이 울렸다.
[응.. 진짜..]
[이뻐..]
[진짜라니깐...]
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다. 아마 그는 어제 나와의 채팅을 친구들에게 이야기 한듯했고 친구들은 정말 내가 왔는지 확인해 보는 것 같았다.
그는 잠시 핸드폰을 내려놓고 이렇게 말했다.
"사실.. 안 올 줄 알고 친구들이랑 술약속을 잡아놨는데, 어쩌지? 친구들이 잠시 합석해도 괜찮냐고 묻는데?"
어떻게 할지 망설였다. 내 마음은 안된다고 말하고 있었지만 잠시 멍하니 생각하는 사이에 그는 다시 핸드폰을 들고 CGV 뒤에 자주가는 그 오뎅탕 집으로 오라고 했다..
동물원 우리 안에서 구경거리가 되는 듯한 느낌이었다.
"무엇을 구경하러 오는 것일까? 채팅으로 만나서 가랭이를 벌리러 온 발정난 암캐 한마리를 구경하러 오는 것일까?"
그는 약속이 엉켜서 미안하다고 웃으며 말했고, 나는 수치스러움을 벗어나려고 소주 몇 잔을 연거푸 마셨다.
오뎅집 미닫이 문이 열리고 찬바람과 함께 친구라는 사람 둘이 들어왔다. 맞은편에 앉아있던 그는 내 옆으로 자리를 옮겼고, 그 친구 둘은 맞은편에 앉았다.
가끔 나를 힐끗힐끗 쳐다보는 눈빛을 제외하고는 그들은 지루한 회사이야기, 주식이야기, 야구이야기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이야기 중간중간에 그들은 나에게 주식해요? 야구 좋아해요? 직장 다니세요? 라고 물었고 난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라고만 짧게 대답했다. 그는 어떤 여자를 채팅으로 만난다고만 이야기했지 나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던거 같았다. 물론 그건 모두 나의 거짓말이겠지만...
그런 와중에 그는 은근슬쩍 내 허벅지 위에 손을 올렸고 그런 그를 나는 가만히 내버려두었다. 그냥 올려놓고만 있던 손이 시간이 지나자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해 내 청바지위로 허벅지를 애무하듯이 만지고 있었다.
1시간 정도를 앉아있다가 그들은 좋은 시간을 보내라는 묘한 뉘앙스의 말을 남기고 떠났다. 곧 우리도 그 오뎅탕 집을 나왔다.
"좀 취하네.. 내일 출근하려면 깨서 차를 가지고 가야되는데.. 좀 쉬러 갈까?"
자러 갈까? 라는 말이었다. 난 고개를 살짝 끄떡였다.
골목을 두개 돌아서 우리는 TIME 이라고 적힌 모텔 안으로 들어갔다.
모텔방 문을 들고 들어서는 이 순간은 언제나 적막했다. 고요했고 찌릿했다.
"먼저 씻어. 차에 핸드폰을 두고 온거 같애. 금방 가져오께"
그 남자는 그렇게 말하고는 모텔 방문을 열고 나갔다. 혼자 남겨진 고요한 모텔방에서 나는 옷을 벗고 팬티와 브라만한채로 욕실안으로 들어가 샤워를 했다.
그냥 다 벗고 나갈까? 아니면 다시 팬티와 브라를 입고 나갈까 잠시 망설였다.
"어차피 벗을거.."
그렇게 발가벗은 채로 팬티와 브라를 손에 들고 욕실문을 열고 나왔을 때, 방안에는 그와 그의 친구 둘.. 그렇게 세명의 남자가 발가벗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숫자는 나를 거쳐간 남자들의 수이고 허리띠라는 단어는 그 남자를 기억하기 위해 적어놓은 것이다. 어느 때는 남자가 사는 도시를 적어놓기도 하고 직업을 적어놓기도 했다. 도시나 직업을 적어놓았을 때는 그들에 대해서 선명하게 떠오르는 이미지가 없을 때였다.
어느 날에는 <19, A>라고 적혀있기도 하다. A라는 것이 처음으로 내 애널이 뚫린 것을 의미했다.
물론 같은 사람과의 두번째 만남부터는 기록하지 않았다. 그건 나에게 아무 의미없는 반복일 뿐이었다.
그렇게 나의 다이어리는 알 수 없는 암호같은 글들로 채워져갔다.
다이어리를 앞으로 넘겨보았다.
3월에도, 2월에도 빨간 글씨가 없었다. 1월의 다이어리.. 24일의 그곳에는 선명하고 굵게 49, 50, 51라고만 적혀있었다. 어떤 기억할 단어도 적혀 있지 않았지만 나는 이 숫자들만으로도 그 날을 또렷히 기억해 낼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2월과 3월에 아무도 만나려고 하지 않았던 이유이기도 했다.
또 다시 악몽이 지속되던 1월의 어느 날, 나는 채팅사이트를 찾았다.
<술 한잔 하실 분>
그가 만든 대화방은 이랬던 것으로 기억된다.
술은 사람을 흥분시키기도 하지만, 또 헤어나올 수 없는 늪처럼 아래로 아래로 빨아들이기도 한다. 술을 한잔하고 쿨한척 원나잇을 하는 건 가장 쉽게 나를 제물로 바치는 방법이기도 했다.
무엇보다 술을 같이 마신다는 건 만남이 전제되어 있었고, 굳이 꽃뱀으로 오해받으며 상대를 유혹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었다.
그는 28살 직장인이라고 소개를 했고 나는 23살 대학생라고 소개했다.
지금 만나자는 그의 제안에 오늘은 너무 늦었다고 내일 보자고 했다. 밤 9시면 그리 늦은 시간은 아니었지만 그가 사는 곳으로 가려면 1시간 정도 시간이 필요했고, 술을 마시고, 가랭이를 벌리고, 돌아오는 시간까지 생각하면 오늘은 무리였다.
나도 오늘 지금 바로 만나고 싶었다. 괴물과 또 하루밤을 같이 보내야한다는 건 너무 힘든 일이었다.
터미널 근처에 산다고 말했다. 나는 늘 역 아니면 터미널 근처에 사는 여자였다.
그는 터미널 앞으로 약속시간에 맞춰 나를 데리러 오겠다고 했다. 나는 그의 핸드폰 번호를 묻고 나의 핸드폰 번호는 알려주지 않았다.
그도 나의 이런 비밀스러운 숨김속에서 내일의 만남이 질퍽해질거라고 짐작을 했을 것이다.
오늘은 어린 학생같아 보여야했다. 청바지에 목까지 올라오는 분홍색 스웨트를 입고 페딩을 걸쳤다.
이젠 친숙해져버린 고속 터미널에서 그에게로 가는 버스를 탔다. 차가운 바깥의 바람과는 달리 버스안의 따뜻한 히터바람은 나를 곧 잠들게 했고 눈을 떴을 땐 이미 그가 사는 곳에 도착해 있었다.
공중전화를 찾아 그에게 전화를 했다.
[여보세요?]
[저에요..]
[정말 왔어? 지금 어디야?]
약간 놀란듯한 말투였다. 약속은 했지만 큰 기대는 하지 않았던 것 같았다. 나는 터미널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했고 그는 이제 막 마치고 나가는 길이라며 20분 정도 걸릴거라고 했다.
공중전화 수화기를 내려놓고 시계를 봤다. 이미 약속시간이 5분이나 지난 상태였다.
나는 먼 길을 달려왔고, 약속시간을 30분이나 지나서 나타날 낮선 남자에게 가랭이를 벌리려고 찬 바람을 맞으면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물론 핑계는 술이었지만...
나는 왜 이런 비참함을 느낄 때 젖어드는 것일까? 알 수 없었다.
"민아씨?"
내 앞에 멈춰선 흰색 아반떼의 유리창이 내려가더니 말끔하게 생긴 한 남자가 나에게 말을 걸었다.
"...네"
그 남자에게 내 이름을 민아라고 말했던 모양이다. 물론 내 이름은 민아가 아니다.
그 남자의 차에 올라탔을 때 그는 "예쁘네"라는 말로 대화를 시작했다. 아마 채팅에서 술먹겠다고 나오는 여자는 못 생겼을거라 생각했던 모양이었다. 차안의 조그마한 시계는 42분을 가르키고 있었다.
차를 타고 가는 동안 그는 어느 학교를 다니는지, 전공이 뭔지, 졸업하고 뭐 할건지에 대해서 물어봤다. 학교 이름은 말하지 않았다. 근처 대학의 영문학과를 다닌다고만 했고, 졸업반이며 졸업하고는 아빠 무역회사에서 일할거라고 했다. 실제로는 아빠는 공무원이었다.
"맥주? 소주?"
그가 물었다. 따끈한 탕이 먹고 싶다고 했고, 우리는 일본식 오뎅집에 들어가 구석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소주와 오뎅탕을 시켰다.
그는 쾌활해보였고 여러가지 농담을 던지며 나를 즐겁게 해주려고 했다. 나도 살짝 웃어주며 맞장구를 쳐줬다.
그 때, 그의 핸드폰이 울렸다.
[응.. 진짜..]
[이뻐..]
[진짜라니깐...]
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다. 아마 그는 어제 나와의 채팅을 친구들에게 이야기 한듯했고 친구들은 정말 내가 왔는지 확인해 보는 것 같았다.
그는 잠시 핸드폰을 내려놓고 이렇게 말했다.
"사실.. 안 올 줄 알고 친구들이랑 술약속을 잡아놨는데, 어쩌지? 친구들이 잠시 합석해도 괜찮냐고 묻는데?"
어떻게 할지 망설였다. 내 마음은 안된다고 말하고 있었지만 잠시 멍하니 생각하는 사이에 그는 다시 핸드폰을 들고 CGV 뒤에 자주가는 그 오뎅탕 집으로 오라고 했다..
동물원 우리 안에서 구경거리가 되는 듯한 느낌이었다.
"무엇을 구경하러 오는 것일까? 채팅으로 만나서 가랭이를 벌리러 온 발정난 암캐 한마리를 구경하러 오는 것일까?"
그는 약속이 엉켜서 미안하다고 웃으며 말했고, 나는 수치스러움을 벗어나려고 소주 몇 잔을 연거푸 마셨다.
오뎅집 미닫이 문이 열리고 찬바람과 함께 친구라는 사람 둘이 들어왔다. 맞은편에 앉아있던 그는 내 옆으로 자리를 옮겼고, 그 친구 둘은 맞은편에 앉았다.
가끔 나를 힐끗힐끗 쳐다보는 눈빛을 제외하고는 그들은 지루한 회사이야기, 주식이야기, 야구이야기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이야기 중간중간에 그들은 나에게 주식해요? 야구 좋아해요? 직장 다니세요? 라고 물었고 난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라고만 짧게 대답했다. 그는 어떤 여자를 채팅으로 만난다고만 이야기했지 나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던거 같았다. 물론 그건 모두 나의 거짓말이겠지만...
그런 와중에 그는 은근슬쩍 내 허벅지 위에 손을 올렸고 그런 그를 나는 가만히 내버려두었다. 그냥 올려놓고만 있던 손이 시간이 지나자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해 내 청바지위로 허벅지를 애무하듯이 만지고 있었다.
1시간 정도를 앉아있다가 그들은 좋은 시간을 보내라는 묘한 뉘앙스의 말을 남기고 떠났다. 곧 우리도 그 오뎅탕 집을 나왔다.
"좀 취하네.. 내일 출근하려면 깨서 차를 가지고 가야되는데.. 좀 쉬러 갈까?"
자러 갈까? 라는 말이었다. 난 고개를 살짝 끄떡였다.
골목을 두개 돌아서 우리는 TIME 이라고 적힌 모텔 안으로 들어갔다.
모텔방 문을 들고 들어서는 이 순간은 언제나 적막했다. 고요했고 찌릿했다.
"먼저 씻어. 차에 핸드폰을 두고 온거 같애. 금방 가져오께"
그 남자는 그렇게 말하고는 모텔 방문을 열고 나갔다. 혼자 남겨진 고요한 모텔방에서 나는 옷을 벗고 팬티와 브라만한채로 욕실안으로 들어가 샤워를 했다.
그냥 다 벗고 나갈까? 아니면 다시 팬티와 브라를 입고 나갈까 잠시 망설였다.
"어차피 벗을거.."
그렇게 발가벗은 채로 팬티와 브라를 손에 들고 욕실문을 열고 나왔을 때, 방안에는 그와 그의 친구 둘.. 그렇게 세명의 남자가 발가벗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최고관리자
| 가입일 | 2016-08-11 | 접속일 | 2024-11-23 |
|---|---|---|---|
| 가입일 | 2016-08-11 | ||
| 접속일 | 2024-11-23 | ||
| 서명 | 황진이-19금 성인놀이터 | ||
| 태그 | |||
| 황진이-무료한국야동,일본야동,중국야동,성인야설,토렌트,성인야사,애니야동
야동토렌트, 국산야동토렌트, 성인토렌트, 한국야동, 중국야동토렌트, 19금토렌트 |
|||
추천 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