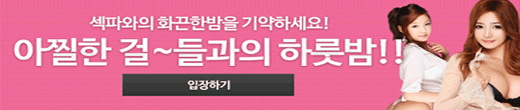숙박업소에 갈 때마다 제일 난감한 순간은 체크인 할 때다. 오가는 돈과 많은 의미가 담긴 듯한 직원의 시선은 결코 익숙해지지 않았다. 쉬어간다는 H의 말에 심드렁한 표정의 호텔의 남자는 3만원이라고 답했다. 3만원이라..3만원으로 살 수 있는 많은 것들이 머리속을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궁핍한 삶은 무엇이든 아깝게 보려하는 경향이 있다. H는 지갑에서 만원짜리와 천원짜리를 꺼내어 두번이나 세어본 후에 방 키와 맞바꾸었다.
엘레베이터는 비좁았고, 복도에 깔린 붉은 색 카페트는 먼지덩어리 같았다. H는 방에 들어가자마자 점퍼를 벗어 바닥에 아무렇게나 던지고는 침대에 걸터 앉아서 담배를 꺼내 물었다. 나는 과거에 그랬듯 내 코트는 물론 그의 점퍼까지도 옷걸이에 잘 걸어주고는 침대 옆 손바닥만한 테이블을 마주한 의자에 앉았다. H는 담배연기를 뿜어대며 신경질적으로 목을 긁어댔다. 잠시 어색한 침묵 속으로 많은 생각들이 오고갔다.
“먼저 씻을래?”
“아니..그 아저씨 오면 봐서..”
H의 얼굴에 또 기분나쁜 미소가 번졌다. 나는 티비를 켜고 채널을 이리 저리 돌려댔다.
“일루 와봐”
“왜? 난 여기가 편해”
“치.. 의자 좁지 않아?”
그는 자신의 재치에 감탄하듯 낄낄 웃어댔다.
“그 아저씬 몇시에 온데?”
“올때 됐는데 잠시만..”
H는 핸드폰을 꺼내서 메시지를 보냈다. 곧 답장이 왔다.
“한 30분 정도 걸린다는데? 일이 남아서 좀 늦는다고 미안하다네?”
“그렇군....”
“방 호실수 알려줬어”
진실이거나, 혹은 거짓이거나. 항상 H의 문제는 순수한 ‘척’, 진실한 ‘척’ 하는 것에 있었다. 그러니 그의 말을 진실로 듣지 못하는 내 문제는 아닐 터.
“그럼 맥주나 사와라”
“그 아저씨가 사오기로 했어”
“나 지금 마시고 싶단 말야”
“좀 참지..”
“아 빨리...이 앞에 편의점 있던데~그 정도도 못해줘?”
남자를 다루는 일은 쉽다. 성욕에 눈이 먼 남자는 훨씬 더 쉽다. H가 나간 후 나는 욕실과 창문, 침대의 상태를 둘러보았다. 불과 몇십분전까지 이곳에서 뒹굴거렸을 연인들의 흔적을 찾는 일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대한민국의 성인들은 참 불쌍하단 생각이 들었다. 나를 포함해서 말이다. 창문으로 늦은 오후 햇살이 가로질러 방으로 비집고 들어오고 있었다. 이 곳에서는 시간과 빛이 다른 방식으로 흐른다. 왜곡되고 비틀렸으며, 느렸다 빨라졌다를 반복하는 몽롱한 순간들. 다시 그곳에 돌아와 앉아있는 거울 속의 내가 낮설게 느껴졌다.
H는 빛과 같은 속도로 맥주가 담긴 비닐봉지를 들고 돌아왔다. 커다란 카스 캔맥주 6개와 참이슬 소주 한 병, 그리고 잡다한 싸구려 과자봉지들. H는 캔맥주 하나를 따서 나에게 건네주고는 나머지는 냉장고에 집어넣었다. 건배~? 무엇을 위해서? 위가 쓰릴 정도로 차가운 맥주가 식도를 타고 거침없이 내려갔다.
“왠지 긴장하는 것 같다?”
“내가?”
“응 너 원래 술 잘 안마시잖아”
본심을 살피려는 듯 그의 눈빛이 어지럽게 흔들렸다. 남자들의 저런 표정은 듣고 싶어하는 대답을 정해놓고 묻는 경우가 많다.
“긴장되지. 난 이런 경험은 처음이잖아. 오빠는 긴장되지 않아?”
“하핫, 뭘 긴장해 오빠가 같이 있는데”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허세였다. 나는 덥다는 듯 일어나 가디건을 천천히 벗어 옷걸이에 걸었다. 그리고 살짝 가슴을 모으며 의자에 다시 앉았다. 자애로운 훈계는 당장 효과를 발휘하여,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맥주캔을 따고 벌컥벌컥 들이켰다.
“못보던 원피스네? 새로 산거야?”
“아니 선물받았어”
“누구한테? 남자?”
“그냥 친구. 구매대행 잘하는 친구가 주문해 준거야”
“그래?”
“응 근데 이거 너무 파인거 같지 않아?”
남자를 잘 다루라는 의도로 신은 여자에게 가슴을 선물해 주신 거라고 믿는다. 언제나 효과 만점이니까. 대신 헤퍼보이거나 너무 드러내 놓는 것은 역효과가 난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다. 의도치 않게..지나치듯 살짝, 그 작은 순간에 화들짝 반응하는 남자들의 모습은 언제나 흥미롭다. 그래봤자 가슴일 뿐인데..
“아니..딱 보기 좋은데 뭐”
“너무 몸이 드러나는 것 같아. 좀 작은거 같기두 하구”
“이뻐 넌 몸이 명품이잖아 좀 드러내놓고 다녀야지”
좋아해야할지 기분나빠해야 할지 애매한 말이었다. 갑자기 H가 내 뒤로 다가와 겨드랑이 사이으로 손을 집어넣으려 했다. 나는 단호하게 하지만 기분나쁘지 않게 그의 손을 밀어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랫만에 만져나 보자”
“싫어~”
“피...”
또 그놈의 ‘피...’ 그는 꼭 토라진 아이같은 표정을 지었다. 한때는 저 표정을 귀엽게 볼 때도 있었는데, 사람은 어쩔수 없이 변하게 마련이다.
“그 아저씨랑은 할꺼야?”
“모르지. 맘에 들면..”
“아..흥분되네?”
“뭐가? 내가 그 아저씨랑 하는걸 보는게?”
“응 흥분돼”
“그게 왜 흥분되는데?”
“글쎄..잘 설명하기 힘든데,
내 여자가 다른 남자랑 하는걸 보는 쾌감? 암튼 그런게 있어”
“뭐래~”
엿같은 소리였다. 누가 자기 여자란 말인가? 몸 몇번 섞었다고 나를 소유하려 하는 오만함이 참기 힘들었다.
“그럼, 우리 지금부터 애인하기로 하고 이 아저씨 오면 나 정말 한다?”
어두워지는 방에서 H의 눈이 희번떡 빛이 났다.
“그래~”
“대신, 당신은 나 털끝하나 건드리면 안돼”
“왜?”
“그냥, 그게 완벽하잖아, 난 그러고 싶어”
“피...”
조금은 다른 의미인 듯한 ‘피...’.
‘딩동~’ 결국 벨이 울렸고, 우리는 잠시 얼어버린 듯 움직이지 않았다. <계속>
엘레베이터는 비좁았고, 복도에 깔린 붉은 색 카페트는 먼지덩어리 같았다. H는 방에 들어가자마자 점퍼를 벗어 바닥에 아무렇게나 던지고는 침대에 걸터 앉아서 담배를 꺼내 물었다. 나는 과거에 그랬듯 내 코트는 물론 그의 점퍼까지도 옷걸이에 잘 걸어주고는 침대 옆 손바닥만한 테이블을 마주한 의자에 앉았다. H는 담배연기를 뿜어대며 신경질적으로 목을 긁어댔다. 잠시 어색한 침묵 속으로 많은 생각들이 오고갔다.
“먼저 씻을래?”
“아니..그 아저씨 오면 봐서..”
H의 얼굴에 또 기분나쁜 미소가 번졌다. 나는 티비를 켜고 채널을 이리 저리 돌려댔다.
“일루 와봐”
“왜? 난 여기가 편해”
“치.. 의자 좁지 않아?”
그는 자신의 재치에 감탄하듯 낄낄 웃어댔다.
“그 아저씬 몇시에 온데?”
“올때 됐는데 잠시만..”
H는 핸드폰을 꺼내서 메시지를 보냈다. 곧 답장이 왔다.
“한 30분 정도 걸린다는데? 일이 남아서 좀 늦는다고 미안하다네?”
“그렇군....”
“방 호실수 알려줬어”
진실이거나, 혹은 거짓이거나. 항상 H의 문제는 순수한 ‘척’, 진실한 ‘척’ 하는 것에 있었다. 그러니 그의 말을 진실로 듣지 못하는 내 문제는 아닐 터.
“그럼 맥주나 사와라”
“그 아저씨가 사오기로 했어”
“나 지금 마시고 싶단 말야”
“좀 참지..”
“아 빨리...이 앞에 편의점 있던데~그 정도도 못해줘?”
남자를 다루는 일은 쉽다. 성욕에 눈이 먼 남자는 훨씬 더 쉽다. H가 나간 후 나는 욕실과 창문, 침대의 상태를 둘러보았다. 불과 몇십분전까지 이곳에서 뒹굴거렸을 연인들의 흔적을 찾는 일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대한민국의 성인들은 참 불쌍하단 생각이 들었다. 나를 포함해서 말이다. 창문으로 늦은 오후 햇살이 가로질러 방으로 비집고 들어오고 있었다. 이 곳에서는 시간과 빛이 다른 방식으로 흐른다. 왜곡되고 비틀렸으며, 느렸다 빨라졌다를 반복하는 몽롱한 순간들. 다시 그곳에 돌아와 앉아있는 거울 속의 내가 낮설게 느껴졌다.
H는 빛과 같은 속도로 맥주가 담긴 비닐봉지를 들고 돌아왔다. 커다란 카스 캔맥주 6개와 참이슬 소주 한 병, 그리고 잡다한 싸구려 과자봉지들. H는 캔맥주 하나를 따서 나에게 건네주고는 나머지는 냉장고에 집어넣었다. 건배~? 무엇을 위해서? 위가 쓰릴 정도로 차가운 맥주가 식도를 타고 거침없이 내려갔다.
“왠지 긴장하는 것 같다?”
“내가?”
“응 너 원래 술 잘 안마시잖아”
본심을 살피려는 듯 그의 눈빛이 어지럽게 흔들렸다. 남자들의 저런 표정은 듣고 싶어하는 대답을 정해놓고 묻는 경우가 많다.
“긴장되지. 난 이런 경험은 처음이잖아. 오빠는 긴장되지 않아?”
“하핫, 뭘 긴장해 오빠가 같이 있는데”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허세였다. 나는 덥다는 듯 일어나 가디건을 천천히 벗어 옷걸이에 걸었다. 그리고 살짝 가슴을 모으며 의자에 다시 앉았다. 자애로운 훈계는 당장 효과를 발휘하여,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맥주캔을 따고 벌컥벌컥 들이켰다.
“못보던 원피스네? 새로 산거야?”
“아니 선물받았어”
“누구한테? 남자?”
“그냥 친구. 구매대행 잘하는 친구가 주문해 준거야”
“그래?”
“응 근데 이거 너무 파인거 같지 않아?”
남자를 잘 다루라는 의도로 신은 여자에게 가슴을 선물해 주신 거라고 믿는다. 언제나 효과 만점이니까. 대신 헤퍼보이거나 너무 드러내 놓는 것은 역효과가 난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다. 의도치 않게..지나치듯 살짝, 그 작은 순간에 화들짝 반응하는 남자들의 모습은 언제나 흥미롭다. 그래봤자 가슴일 뿐인데..
“아니..딱 보기 좋은데 뭐”
“너무 몸이 드러나는 것 같아. 좀 작은거 같기두 하구”
“이뻐 넌 몸이 명품이잖아 좀 드러내놓고 다녀야지”
좋아해야할지 기분나빠해야 할지 애매한 말이었다. 갑자기 H가 내 뒤로 다가와 겨드랑이 사이으로 손을 집어넣으려 했다. 나는 단호하게 하지만 기분나쁘지 않게 그의 손을 밀어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랫만에 만져나 보자”
“싫어~”
“피...”
또 그놈의 ‘피...’ 그는 꼭 토라진 아이같은 표정을 지었다. 한때는 저 표정을 귀엽게 볼 때도 있었는데, 사람은 어쩔수 없이 변하게 마련이다.
“그 아저씨랑은 할꺼야?”
“모르지. 맘에 들면..”
“아..흥분되네?”
“뭐가? 내가 그 아저씨랑 하는걸 보는게?”
“응 흥분돼”
“그게 왜 흥분되는데?”
“글쎄..잘 설명하기 힘든데,
내 여자가 다른 남자랑 하는걸 보는 쾌감? 암튼 그런게 있어”
“뭐래~”
엿같은 소리였다. 누가 자기 여자란 말인가? 몸 몇번 섞었다고 나를 소유하려 하는 오만함이 참기 힘들었다.
“그럼, 우리 지금부터 애인하기로 하고 이 아저씨 오면 나 정말 한다?”
어두워지는 방에서 H의 눈이 희번떡 빛이 났다.
“그래~”
“대신, 당신은 나 털끝하나 건드리면 안돼”
“왜?”
“그냥, 그게 완벽하잖아, 난 그러고 싶어”
“피...”
조금은 다른 의미인 듯한 ‘피...’.
‘딩동~’ 결국 벨이 울렸고, 우리는 잠시 얼어버린 듯 움직이지 않았다. <계속>

최고관리자
| 가입일 | 2016-08-11 | 접속일 | 2024-11-23 |
|---|---|---|---|
| 가입일 | 2016-08-11 | ||
| 접속일 | 2024-11-23 | ||
| 서명 | 황진이-19금 성인놀이터 | ||
| 태그 | |||
| 황진이-무료한국야동,일본야동,중국야동,성인야설,토렌트,성인야사,애니야동
야동토렌트, 국산야동토렌트, 성인토렌트, 한국야동, 중국야동토렌트, 19금토렌트 |
|||
추천 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