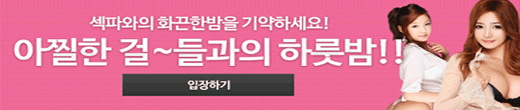방과 후.
야간자율학습을 하지 않는 나는 언제나 정규수업을 마치고는 곧바로 귀가한다. 오늘도 가방을 메고 평소처럼 교문을 향해 내리막길을 걸었다. 평소와 다른 점이 있다면, 동행이 뒤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뒤따른다기 보단 바로 옆에서 걷고 있다. 현재 나와 함께 걷고 있는 사람은, 정지은이라는 여학생이다.
같은 반이면서도 별로 대화를 하지 않았던 학생(나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녀석들과 대화한 적이 없다만)이었지만, 최근 강렬한 일을 두 번 정도 겪고 나서 어느 정도 거리낌 없이 대화할 수 있게 되었다.
“너 말야. 야자해야 되지 않아?”
“괜찮아. 하루쯤 빠져도.”
“불량학생이네.”
“어차피 오늘 감시하는 선생님이 없는 날이야.”
정말로 불량학생이네.
정규 수업이 끝나고 가방을 챙기고 있던 나에게 지은이 다가왔다. 그리고는 “같이 가자.”라고. 당연히 대답은 NO였지만 지은은 멋대로 따라왔다. 처음엔 도망칠까 생각했지만, 체육시간 조차도 제대로 참여하지 않는 내가 제대로 운동을 배운 지은을 따돌릴 수는 없을 것 같아서 그냥 포기했다.
그래도 마냥 따라오게 할 수는 없어서,
“너 왜따라오는 거야?”
물었지만.
“계속 따라다닌다고 했잖아.”
천연덕스럽게 말한다. 아까 했던 말이 다른 속뜻이 숨이 있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의 의미일 줄이야. 속뜻이 없으나 있으나 곤란한 건 똑같다만.
“어디까지 따라올 생각이야?”
“너희 집까지.”
“농담이지?”
“농담 안 해.”
성공률은 0%에 가깝지만, 도망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정말로 도망쳐볼까?
“도망쳐도 소용없어. 너희 집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거든.”
지은이 내 마음을 읽은 것처럼 말했다. 아니, 읽은 것처럼이 아니라 정말로 읽었다. 내 딴에는 속마음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편이라고 생각해왔는데, 착각이었던 걸까. 아니면 말로만 듣던 독심술을 내가 당하고 있는 건가.
“너 혹시 독심술 할 줄 알아?”
“아니. 그냥. 네 생각이 뻔하니까.”
아, 내 생각이 뻔해서 그랬군.
더 이상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나에게 특출난 말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서로 공통된 관심사가 있는 것도 아니다보니 대화의 폭이 좁을 수밖에 없다.
냉정히 생각해보면 딱히 이야깃거리를 떠올릴 필요는 없다고 본다. 친한 사이도 아니고, 사귀는 사이도 아니다. 단지 어제오늘 말을 섞어본 사이일 뿐인 것이다. 굳이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 말할거리를 만들기 위해 고심할 필요는 없다.
없는데.
아니, 역시 있다.
왜냐하면, 지은은 날 좋아한다고 말했으니까.
좋아한다는 것은, 선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수많은 사람들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선택된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이유는 충분하다. 그것만으로도 이야깃거리를 만들기 위해 고심할 이유가 차고 넘친다.
“지은아.”
“응.”
“머리 자른 거, 후회하지 않아?”
오늘 아침 지은을 본 뒤 계속해서 묻고 싶었던 말을 이제야 꺼냈다. 대답이 어떻게 나올지 무서웠기 때문에 지금까지 망설였던 물음.
“후회 안 해.”
지은은 망설임 없이 그렇게 말했다.
“난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어. 이렇게 머리를 자르지 않았으면 넌 여전히 날 무시하고 있을 테니까.”
“무시한 적 없어.”
“아니.”
지은은 딱 잘라 말했다.
“너는 분명 내가 이렇게라도 하지 않았다면, 내말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았을 거야.”
“…….”
확실히, 내 생각도 지은과 같았기 때문에 반박할 수 없었다. 그러나, 반박할 수 없다는 사실에 조금 화가 났다.
“그래도, 아깝지 않아? 오랫동안 길렀을 텐데.”
“3년. 3년 동안 기른 거야.”
“…….”
지은에게 한없이 미안하다. 생각 없이 던진 한마디로 3년이란 오랜 시간을 날려버리게 만들었다. 눈을 마주칠 수 없었다. 흘끗 눈을 돌리는 일도 무서워서 할 수 없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그저 말없이 걷는 일 뿐이었다.
정면을 쳐다보며 걷고 있는데, 갑자기 지은이 내 앞에 마주섰다. 나도 멈춰섰다. 순간적으로 눈이 마주쳐버려서 얼른 눈을 피했다. 그러자 지은이 쿡, 하고 웃었다.
“괜찮아. 미안해 할 필요 없어. 내가 선택한 일이니까. 그리고, 머리 관리하기도 귀찮았던 차에 잘됐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거짓말.”
“거짓말이야. 진짜 열심히 길렀는데, 아까워.”
“미안.”
눈을 아예 내리깔았다. 나는 어제부터 지은에게 미안해할 일만 되풀이하고 있다. 그런데도 지은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하다. 그래서 더욱 미안했다.
나를 가만히 놔둘 지은이 아니었다. 갑자기 나에게 얼굴을 가까이 들이대고 눈을 마주쳐온다. 고개를 돌려 피하려고 했지만 양손으로 얼굴을 잡고 정면으로 고정시켰다. 나는 그저 시선을 피하기위해 안간힘을 쓸 뿐이다.
“정말로 미안하면 나와 눈을 마주쳐.”
지은이 말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지은의 눈을 바라보았다. 맑은 눈이다. 왜 나 같은 녀석을 좋아하는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올곧다. 그래서 다시 눈을 피했다.
“어라, 눈을 피하네. 미안하지 않은 건가?”
“아냐.”
당장 부정했다.
“정말로 미안한 거야?”
“응. 정말로 미안. 내가 잘못했어.”
“그럼 있지이.”
이번엔 지은이 나와 눈을 피했다.
“키스해줄래?”
얼른 내 얼굴을 잡고 있던 지은의 양손을 잡아 아래로 내렸다. 갑자기 달아올라버린 얼굴의 열기를 느낄까봐서다. 내가 아무리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라지만, 이런 상황에서 아무렇지도 않을 수는 없었다. 어떻게 해서든 동요하지 않는 척을 하고 있지만. 붉게 물들어버린 얼굴은 달리 손을 쓸 수가 없다.
지은도 꽤나 부끄러운지 얼굴에 홍조를 띄우고 고개를 옆으로 틀었다.
“너 진짜 쪽팔리는 말 할래.”
“나도 후회중이야.”
지은이 살짝 혀를 내밀며 귀엽게 웃었다.
나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정말 타이밍 좋게 아무도 없었다.
아, 정말 왜 이 대낮에 아무도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 없는 거냐고. 하교하고 있던 다른 애들 다 어디 갔어. 쓰레기 버리러 나오는 아줌마는. 정말 마법 같은 타이밍이구나.
심호흡을 한 번 했다. 그리고는 지은을 향해 양손을 내밀었다. 지은을 천천히 끌어당겼다. 아무런 저항 없이 가까워지는 지은의 얼굴. 나도 지은에게 다가가기 위해 발꿈치를 들었다. 지은이 눈을 감으며 양팔로 나를 껴안았다.
나도 눈을 감았다.
-----------------------------------------------------------------------------------------------------
점점 야설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실력의 한계도 느끼고 있습니다.
야간자율학습을 하지 않는 나는 언제나 정규수업을 마치고는 곧바로 귀가한다. 오늘도 가방을 메고 평소처럼 교문을 향해 내리막길을 걸었다. 평소와 다른 점이 있다면, 동행이 뒤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뒤따른다기 보단 바로 옆에서 걷고 있다. 현재 나와 함께 걷고 있는 사람은, 정지은이라는 여학생이다.
같은 반이면서도 별로 대화를 하지 않았던 학생(나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녀석들과 대화한 적이 없다만)이었지만, 최근 강렬한 일을 두 번 정도 겪고 나서 어느 정도 거리낌 없이 대화할 수 있게 되었다.
“너 말야. 야자해야 되지 않아?”
“괜찮아. 하루쯤 빠져도.”
“불량학생이네.”
“어차피 오늘 감시하는 선생님이 없는 날이야.”
정말로 불량학생이네.
정규 수업이 끝나고 가방을 챙기고 있던 나에게 지은이 다가왔다. 그리고는 “같이 가자.”라고. 당연히 대답은 NO였지만 지은은 멋대로 따라왔다. 처음엔 도망칠까 생각했지만, 체육시간 조차도 제대로 참여하지 않는 내가 제대로 운동을 배운 지은을 따돌릴 수는 없을 것 같아서 그냥 포기했다.
그래도 마냥 따라오게 할 수는 없어서,
“너 왜따라오는 거야?”
물었지만.
“계속 따라다닌다고 했잖아.”
천연덕스럽게 말한다. 아까 했던 말이 다른 속뜻이 숨이 있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의 의미일 줄이야. 속뜻이 없으나 있으나 곤란한 건 똑같다만.
“어디까지 따라올 생각이야?”
“너희 집까지.”
“농담이지?”
“농담 안 해.”
성공률은 0%에 가깝지만, 도망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정말로 도망쳐볼까?
“도망쳐도 소용없어. 너희 집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거든.”
지은이 내 마음을 읽은 것처럼 말했다. 아니, 읽은 것처럼이 아니라 정말로 읽었다. 내 딴에는 속마음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편이라고 생각해왔는데, 착각이었던 걸까. 아니면 말로만 듣던 독심술을 내가 당하고 있는 건가.
“너 혹시 독심술 할 줄 알아?”
“아니. 그냥. 네 생각이 뻔하니까.”
아, 내 생각이 뻔해서 그랬군.
더 이상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나에게 특출난 말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서로 공통된 관심사가 있는 것도 아니다보니 대화의 폭이 좁을 수밖에 없다.
냉정히 생각해보면 딱히 이야깃거리를 떠올릴 필요는 없다고 본다. 친한 사이도 아니고, 사귀는 사이도 아니다. 단지 어제오늘 말을 섞어본 사이일 뿐인 것이다. 굳이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 말할거리를 만들기 위해 고심할 필요는 없다.
없는데.
아니, 역시 있다.
왜냐하면, 지은은 날 좋아한다고 말했으니까.
좋아한다는 것은, 선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수많은 사람들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선택된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이유는 충분하다. 그것만으로도 이야깃거리를 만들기 위해 고심할 이유가 차고 넘친다.
“지은아.”
“응.”
“머리 자른 거, 후회하지 않아?”
오늘 아침 지은을 본 뒤 계속해서 묻고 싶었던 말을 이제야 꺼냈다. 대답이 어떻게 나올지 무서웠기 때문에 지금까지 망설였던 물음.
“후회 안 해.”
지은은 망설임 없이 그렇게 말했다.
“난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어. 이렇게 머리를 자르지 않았으면 넌 여전히 날 무시하고 있을 테니까.”
“무시한 적 없어.”
“아니.”
지은은 딱 잘라 말했다.
“너는 분명 내가 이렇게라도 하지 않았다면, 내말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았을 거야.”
“…….”
확실히, 내 생각도 지은과 같았기 때문에 반박할 수 없었다. 그러나, 반박할 수 없다는 사실에 조금 화가 났다.
“그래도, 아깝지 않아? 오랫동안 길렀을 텐데.”
“3년. 3년 동안 기른 거야.”
“…….”
지은에게 한없이 미안하다. 생각 없이 던진 한마디로 3년이란 오랜 시간을 날려버리게 만들었다. 눈을 마주칠 수 없었다. 흘끗 눈을 돌리는 일도 무서워서 할 수 없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그저 말없이 걷는 일 뿐이었다.
정면을 쳐다보며 걷고 있는데, 갑자기 지은이 내 앞에 마주섰다. 나도 멈춰섰다. 순간적으로 눈이 마주쳐버려서 얼른 눈을 피했다. 그러자 지은이 쿡, 하고 웃었다.
“괜찮아. 미안해 할 필요 없어. 내가 선택한 일이니까. 그리고, 머리 관리하기도 귀찮았던 차에 잘됐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거짓말.”
“거짓말이야. 진짜 열심히 길렀는데, 아까워.”
“미안.”
눈을 아예 내리깔았다. 나는 어제부터 지은에게 미안해할 일만 되풀이하고 있다. 그런데도 지은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하다. 그래서 더욱 미안했다.
나를 가만히 놔둘 지은이 아니었다. 갑자기 나에게 얼굴을 가까이 들이대고 눈을 마주쳐온다. 고개를 돌려 피하려고 했지만 양손으로 얼굴을 잡고 정면으로 고정시켰다. 나는 그저 시선을 피하기위해 안간힘을 쓸 뿐이다.
“정말로 미안하면 나와 눈을 마주쳐.”
지은이 말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지은의 눈을 바라보았다. 맑은 눈이다. 왜 나 같은 녀석을 좋아하는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올곧다. 그래서 다시 눈을 피했다.
“어라, 눈을 피하네. 미안하지 않은 건가?”
“아냐.”
당장 부정했다.
“정말로 미안한 거야?”
“응. 정말로 미안. 내가 잘못했어.”
“그럼 있지이.”
이번엔 지은이 나와 눈을 피했다.
“키스해줄래?”
얼른 내 얼굴을 잡고 있던 지은의 양손을 잡아 아래로 내렸다. 갑자기 달아올라버린 얼굴의 열기를 느낄까봐서다. 내가 아무리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라지만, 이런 상황에서 아무렇지도 않을 수는 없었다. 어떻게 해서든 동요하지 않는 척을 하고 있지만. 붉게 물들어버린 얼굴은 달리 손을 쓸 수가 없다.
지은도 꽤나 부끄러운지 얼굴에 홍조를 띄우고 고개를 옆으로 틀었다.
“너 진짜 쪽팔리는 말 할래.”
“나도 후회중이야.”
지은이 살짝 혀를 내밀며 귀엽게 웃었다.
나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정말 타이밍 좋게 아무도 없었다.
아, 정말 왜 이 대낮에 아무도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 없는 거냐고. 하교하고 있던 다른 애들 다 어디 갔어. 쓰레기 버리러 나오는 아줌마는. 정말 마법 같은 타이밍이구나.
심호흡을 한 번 했다. 그리고는 지은을 향해 양손을 내밀었다. 지은을 천천히 끌어당겼다. 아무런 저항 없이 가까워지는 지은의 얼굴. 나도 지은에게 다가가기 위해 발꿈치를 들었다. 지은이 눈을 감으며 양팔로 나를 껴안았다.
나도 눈을 감았다.
-----------------------------------------------------------------------------------------------------
점점 야설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실력의 한계도 느끼고 있습니다.

최고관리자
| 가입일 | 2016-08-11 | 접속일 | 2024-11-23 |
|---|---|---|---|
| 가입일 | 2016-08-11 | ||
| 접속일 | 2024-11-23 | ||
| 서명 | 황진이-19금 성인놀이터 | ||
| 태그 | |||
| 황진이-무료한국야동,일본야동,중국야동,성인야설,토렌트,성인야사,애니야동
야동토렌트, 국산야동토렌트, 성인토렌트, 한국야동, 중국야동토렌트, 19금토렌트 |
|||
추천 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