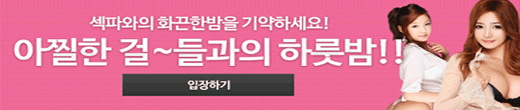Terms&Essense -3-
공공의 적 바퀴벌레 선생의 한 말씀: 안 야해. 전혀 흥분되지 않는다구. 이딴 거, 왜 올리냐?!
킬리군:... 표현의 자유다.
바퀴벌레:네놈의 그 알량하고 허접한 쓰레기같은 졸저에 자유와 같은 숭고하고 엄숙한 수식어를 붙여 미화한다는 것 자체가 언어 도단이다!
킬리군:아, 씨바. 내가 그래 이딴 쓰레기 적는다고 네놈이 처박혀 있는 냄새나는 시궁창의 썩은 물이 줄어드냐, 아니면 네가 그 엿먹을 뱃속에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 그 저주받을 수정란들이 썩어드냐?
...안 화끈해서 죄송합니다.
-------
그리고 다시 그녀와 조우하게 된 것은 바로 그 날, 선생님의 꿈을 꾼 바로 그 날이었다. 예지몽이었나? 그녀는 옆구리에 파일 비슷한 것을 낀 채 바야흐로 친구들과 함께 지나가고 있는 중이었다.
복도가 그다지 넓지 않은 것을 감안한다면, 내가 아무리 한 귀퉁이에 서 있는다고 해도 그녀들이(남자는 없었으니까)일렬로 지나가기엔 비좁은 곳이었다. 따라서, 횡대로 수다떨며 지나가던 그녀들은 내 위치에 즈음하여 한 명이 뒤로 빠지게 되었고, 그 뒤로 빠진 사람은 차민정이었다.
"…"
빤히 쳐다보지도 않았다. 다만 사람이 지나간 것이다, 이 정도의 느낌과 시선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서 있었을 따름이다. 그것은 그녀도 이야기에 정신이 팔려 마찬가지였다고 생각된다.
그렇지만, 내가 있는 위치를 경과한지 몇 걸음 되지 않아 그녀가 뒤돌아 본 것은 우연일까? 표정은 모르겠다. 그녀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동시에 나도 뒤돌아 등을 보이게 했으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반대편을 걸어가는 나에게 왜? 아는 사람이야? 으으응… 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하긴 그렇지. 나도 그녀를 아는 건 아니지.
아는 사람은 아니지.
아는 사람과 닮았을 뿐이지.
집착하는 이유도 그거다.
나에게 있어, 그녀의 외모 말고는―
의미가 없어.
그 우연한 만남 뒤로, 이상하게도 그녀를 자주 만났다.
아니지, 만난다는 것은 서로를 알 때나 하는 말이지. 나와 그녀의 경우는 "마주친" 것에 불과할 뿐이다. 장소는 실로 평범한 곳, 학생 식당, 구내 매점, 교정 내 벤치, 복도 등등이었다. 어쩌면 우리는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마주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긴 그건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어떤 사람과 마주치는 것은 사실, 인식하지 못해서 그런 거지 수백번도 넘을 것이다. 서로가 서로에게 의미가 없으면 몇백번 몇천번을 마주쳐도 만남이 되지 않는다. 마주침에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만남이 된다. 그리고 기억되는 것이다.
그녀는 그 스쳐지나감에 가끔씩 고개를 꺾어 내 쪽을 쳐다보는 일이 있는 것 같았으나, 열번 중에 세 번에 불과할 정도로 둔감한(!)반응성을 보여주었다.
뭐, 스토커는 아니다. 그건 의도적으로 뒤를 졸졸 따라 다니는 거고, 나는 별로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자주 마주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자주 마주쳤으면서도, 그녀에게 놈씨가 있다는 것을 안 건 그날이 처음이었다. 교정 벤치에 둘이 한가롭게 앉아 있었다. 대학 이성교제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은 그저 남녀 둘이 벤치에 앉아 있는 것이 뭐가 교제의 증거가 되냐고 비웃을지 모르지만, 글쎄,
팔짱을 끼고 있다는 것은 교제의 극명한 증거 중 하나로 채택될 가능성이 농후한 스킨쉽 아닌가?
놈씨, 그러니까 그녀의 남자친구로 추정되는 놈은 내 고교때의 기준으로 보자면 "양아치"로 분류될 머리꼴을 하고 있었다. 하긴 요즘같이 헤어스타일이 자유분방한 때에 무슨 영감같은 소리냐고 면박먹을 지도 모른다. 어울리게, 나는 염색같은 건 경멸하고, 머리손질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는다. 길어서 거슬리면 자른다. 일부러 기르다니, 귀찮은 짓 아닌가.
뭐, 얼굴은 잘생기긴 했다. 키도 훤칠하게 큰 것 같고. 패션감각도 좋아 보였다.
…"노는 놈" 이군. 아, 내 고교때의 기준으로 말이다.
그녀는 즐거운 얼굴이었다. 연신 웃고, 얘기하고 있었다.
선생님도 즐거우면 저렇게 웃었다. 망할, 웃는 표정까지 판박이잖아.
그녀와 나는 아무 관계도 아니다. 처음부터 그녀와 가까운 관계로 되고싶다고 소망하지는 않았다. 선생님과 닮은 얼굴을 이대로 놓치고 싶지 않았다는 생각 뿐이었다.
그렇지만, 그런 얼굴을 한 사람을 잠시나마 소유하는 놈이 생기다니, 기분이 더러웠다.
"…훼방놓아 버릴까."
이런 엉뚱한 생각마저 들었다.
그녀와 가까워지든 말든, 그건 상관없다.
하지만 선생님을 닮은 사람을 누군가가, 그러니까 저 자식이 만지고, 혼자서 많은 시간을 얘기하게끔 내버려 두고 싶지는 않다.
생각을 하는 와중에도, 녀석은 그녀의 얼굴을 만진다든가 하고 있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다. 이 자식이, 만지지 마! …라고, 속으로 외쳐도 소용없다.
…
저 녀석은 그녀의 어디를 보고 사귀는 것일까?
그러니까…
무엇이 조건이지?
나는 녀석의 밉살스러운 얼굴을 멀리서 쏘아보며 생각했다.
네놈은 무엇을 교제의 "조건"으로 하고 있냐?
무엇 때문에 그녀를 네 옆에 앉혀두고 있느냔 말이다.
…너도, 나도.
결국은 같은 결과로 돌아갈 거다.
나는 자신도 모르게 냉소와 고소를 복합시킨 표정을 지으며, 몸을 돌렸다.
공공의 적 바퀴벌레 선생의 한 말씀: 안 야해. 전혀 흥분되지 않는다구. 이딴 거, 왜 올리냐?!
킬리군:... 표현의 자유다.
바퀴벌레:네놈의 그 알량하고 허접한 쓰레기같은 졸저에 자유와 같은 숭고하고 엄숙한 수식어를 붙여 미화한다는 것 자체가 언어 도단이다!
킬리군:아, 씨바. 내가 그래 이딴 쓰레기 적는다고 네놈이 처박혀 있는 냄새나는 시궁창의 썩은 물이 줄어드냐, 아니면 네가 그 엿먹을 뱃속에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 그 저주받을 수정란들이 썩어드냐?
...안 화끈해서 죄송합니다.
-------
그리고 다시 그녀와 조우하게 된 것은 바로 그 날, 선생님의 꿈을 꾼 바로 그 날이었다. 예지몽이었나? 그녀는 옆구리에 파일 비슷한 것을 낀 채 바야흐로 친구들과 함께 지나가고 있는 중이었다.
복도가 그다지 넓지 않은 것을 감안한다면, 내가 아무리 한 귀퉁이에 서 있는다고 해도 그녀들이(남자는 없었으니까)일렬로 지나가기엔 비좁은 곳이었다. 따라서, 횡대로 수다떨며 지나가던 그녀들은 내 위치에 즈음하여 한 명이 뒤로 빠지게 되었고, 그 뒤로 빠진 사람은 차민정이었다.
"…"
빤히 쳐다보지도 않았다. 다만 사람이 지나간 것이다, 이 정도의 느낌과 시선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서 있었을 따름이다. 그것은 그녀도 이야기에 정신이 팔려 마찬가지였다고 생각된다.
그렇지만, 내가 있는 위치를 경과한지 몇 걸음 되지 않아 그녀가 뒤돌아 본 것은 우연일까? 표정은 모르겠다. 그녀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동시에 나도 뒤돌아 등을 보이게 했으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반대편을 걸어가는 나에게 왜? 아는 사람이야? 으으응… 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하긴 그렇지. 나도 그녀를 아는 건 아니지.
아는 사람은 아니지.
아는 사람과 닮았을 뿐이지.
집착하는 이유도 그거다.
나에게 있어, 그녀의 외모 말고는―
의미가 없어.
그 우연한 만남 뒤로, 이상하게도 그녀를 자주 만났다.
아니지, 만난다는 것은 서로를 알 때나 하는 말이지. 나와 그녀의 경우는 "마주친" 것에 불과할 뿐이다. 장소는 실로 평범한 곳, 학생 식당, 구내 매점, 교정 내 벤치, 복도 등등이었다. 어쩌면 우리는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마주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긴 그건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어떤 사람과 마주치는 것은 사실, 인식하지 못해서 그런 거지 수백번도 넘을 것이다. 서로가 서로에게 의미가 없으면 몇백번 몇천번을 마주쳐도 만남이 되지 않는다. 마주침에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만남이 된다. 그리고 기억되는 것이다.
그녀는 그 스쳐지나감에 가끔씩 고개를 꺾어 내 쪽을 쳐다보는 일이 있는 것 같았으나, 열번 중에 세 번에 불과할 정도로 둔감한(!)반응성을 보여주었다.
뭐, 스토커는 아니다. 그건 의도적으로 뒤를 졸졸 따라 다니는 거고, 나는 별로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자주 마주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자주 마주쳤으면서도, 그녀에게 놈씨가 있다는 것을 안 건 그날이 처음이었다. 교정 벤치에 둘이 한가롭게 앉아 있었다. 대학 이성교제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은 그저 남녀 둘이 벤치에 앉아 있는 것이 뭐가 교제의 증거가 되냐고 비웃을지 모르지만, 글쎄,
팔짱을 끼고 있다는 것은 교제의 극명한 증거 중 하나로 채택될 가능성이 농후한 스킨쉽 아닌가?
놈씨, 그러니까 그녀의 남자친구로 추정되는 놈은 내 고교때의 기준으로 보자면 "양아치"로 분류될 머리꼴을 하고 있었다. 하긴 요즘같이 헤어스타일이 자유분방한 때에 무슨 영감같은 소리냐고 면박먹을 지도 모른다. 어울리게, 나는 염색같은 건 경멸하고, 머리손질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는다. 길어서 거슬리면 자른다. 일부러 기르다니, 귀찮은 짓 아닌가.
뭐, 얼굴은 잘생기긴 했다. 키도 훤칠하게 큰 것 같고. 패션감각도 좋아 보였다.
…"노는 놈" 이군. 아, 내 고교때의 기준으로 말이다.
그녀는 즐거운 얼굴이었다. 연신 웃고, 얘기하고 있었다.
선생님도 즐거우면 저렇게 웃었다. 망할, 웃는 표정까지 판박이잖아.
그녀와 나는 아무 관계도 아니다. 처음부터 그녀와 가까운 관계로 되고싶다고 소망하지는 않았다. 선생님과 닮은 얼굴을 이대로 놓치고 싶지 않았다는 생각 뿐이었다.
그렇지만, 그런 얼굴을 한 사람을 잠시나마 소유하는 놈이 생기다니, 기분이 더러웠다.
"…훼방놓아 버릴까."
이런 엉뚱한 생각마저 들었다.
그녀와 가까워지든 말든, 그건 상관없다.
하지만 선생님을 닮은 사람을 누군가가, 그러니까 저 자식이 만지고, 혼자서 많은 시간을 얘기하게끔 내버려 두고 싶지는 않다.
생각을 하는 와중에도, 녀석은 그녀의 얼굴을 만진다든가 하고 있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다. 이 자식이, 만지지 마! …라고, 속으로 외쳐도 소용없다.
…
저 녀석은 그녀의 어디를 보고 사귀는 것일까?
그러니까…
무엇이 조건이지?
나는 녀석의 밉살스러운 얼굴을 멀리서 쏘아보며 생각했다.
네놈은 무엇을 교제의 "조건"으로 하고 있냐?
무엇 때문에 그녀를 네 옆에 앉혀두고 있느냔 말이다.
…너도, 나도.
결국은 같은 결과로 돌아갈 거다.
나는 자신도 모르게 냉소와 고소를 복합시킨 표정을 지으며, 몸을 돌렸다.

최고관리자
| 가입일 | 2016-08-11 | 접속일 | 2024-11-23 |
|---|---|---|---|
| 가입일 | 2016-08-11 | ||
| 접속일 | 2024-11-23 | ||
| 서명 | 황진이-19금 성인놀이터 | ||
| 태그 | |||
| 황진이-무료한국야동,일본야동,중국야동,성인야설,토렌트,성인야사,애니야동
야동토렌트, 국산야동토렌트, 성인토렌트, 한국야동, 중국야동토렌트, 19금토렌트 |
|||
추천 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