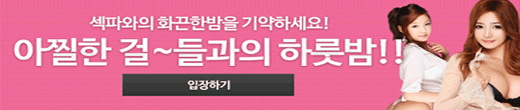[번역] 치옥의 서유기 32편
미고니 현낭(美苦尼 玄娘) ~치옥의 서유기 32편
꿀꺽, 현낭은 침을 삼켰다.
피부 밑으로 흐르는 신경이 묘한 간지러움에 자극 받고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피부가 평상시와는 다르게 솟아오르는 듯한 느낌에 기분이 좋았다.
오공의 금고봉이 끈적이는 액체의 실을 늘어뜨리며 격렬하게 들락날락 거렸다.
‘저것이, 오공씨의 금고봉…’
현낭은 열정적인 시선으로 그것을 응시했다. 언제나 보아온 것이었지만 지금은 몹시 추해 보였다. 아니, 그렇기보다는 오히려 사랑스럽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현낭은 그런 생각을 오공의 소지품이기 때문이라고 애써 생각했다. 그러고 보니 현낭은 아직 금고봉을 만져본 적도 없었다.
오공에게 금고봉이라는 것은 매우 무거워 아무리 강한 요괴라고 하여도 들 수조차 없다고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취란은 들어올리기도 힘들다는 금고봉을 가지고 이런 불쾌한 일에 사용할 수 있는 걸까? 여자의 약한 힘으로도 들 수 있도록 변하는 것도 가능한 것일까?
자신은 아직 손조차 대보지 못했는데, 취란은 추잡한 행위에 오공의 금고봉을 사용하고 있다.
현낭은 순간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흐으으으응, 아, 하앙, 오,온다아아앗!”
취란이 한층 더 큰소리로 외치며 절정에 달했다. 온몸을 비틀며 격렬한 쾌감을 참고 있었다. 하지만, 또다시 새로운 쾌감을 얻기 위해 흐트러진 양다리를 더욱 높게 들어 올렸다.
엉덩이 쪽의 구멍이 하늘을 향하도록 몸을 구부리고 왼손으로는 금고봉의 끝을 이끌어 다리와 수직이 되게 세웠다.
“하악”
끓어오를 것같이 가열된 밀호가 금고봉의 요철에 도려내어지며 취란으로 하여금 비명을 지르게 했다.
앞구르기를 하려다 중간에 멈춘 것 같은 모습에서 다리는 V자 형태로 벌어져 있었고, 발가락은 땅에 닫고 있었다. 머리는 아래, 엉덩이는 위에 있는 모습으로 금고봉을 수직으로 꽂은 모습은 현낭이 보기에는 마치 고깃덩이로 만들어진 화분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아앙… 이거… 대단해…”
취란은 계속 자극하기 위해서 자신의 속에서부터 우뚝 솟은 금고봉을 휘적휘적 돌렸다.
취란의 자궁 안이 휘저어지고 있는 모습이 상상되어 현낭은 꿀꺽 침을 삼켰다.
취란의 몸은 매우 부드러웠다.
취란은 오른쪽 다리를 머리 쪽으로 가져가더니 목 뒤로 걸쳤다. 돼지 요괴에게 온갖 변태적인 행위를 강요당하는 사이 이렇게까지 부드러워진 것이었다.
취란은 금고봉을 고정하고 있던 손을 오른손으로 바꾸더니 왼손을 사용하여 왼쪽 다리도 목뒤로 걸쳤다. 이렇게 취란은 고간에서 항문까지 고스란히 드러나는 부끄러운 자세로 스스로 구속을 하더니 왼손을 엉덩이 구멍으로 가져갔다.
“힉”
작은 비명을 지르며 손으로 입을 가린 것은 현낭 쪽이었다.
‘무,무슨 짓을…’
취란의 가늘고 흰 손가락이 집요한 손놀림으로 항문의 구덩이를 어루만지고 있었다.
그런 짓이 기분 좋다니…라고 생각하면서도 현낭은 눈을 떼지 못하고 보고 있노라니 자신의 엉덩이 구멍까지 근질근질해져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휘적휘적 금고봉이 휘저어 질 때마다 넘쳐 나오는 액체가 엉덩이의 구덩이에도 쌓여갔다. 그 미끄러움을 이용하여 취란은 손가락 끝을 조금씩 넣어갔다.
“학, 학, 하아, 아…”
취란은 손가락을 작게 왕복운동 시키며 발정 난 암캐 같은 신음을 흘렸다.
현낭은 취란의 손가락이 움직일 때마다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다. 엉덩이 구멍에 축축하고 가느다란 것이 침입해 오는 듯한 느낌이 들어 자신도 모르게 항문에 힘이 들어갔다.
얼굴을 들면 눈앞에 오공의 금고봉이 휘적휘적 원을 그리며 취란의 밀호를 범하고 있었다.
사실 현낭은 전부터 이 금고봉을 한 번 만져보고 싶었었다. 어떻게 이런 찬스가 다시 올까? 여기서 만져보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 할 것 같았다.
‘게다가 빠지지 않게 제대로 고정만 한다면 오공씨가 말한 것을 돕게 되는 거야.’
현낭은 기묘한 정당화를 생각해 내며 떨리는 손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조심조심 손을 뻗어 갔다.
현낭은 금고봉의 회전을 따라가며 그 장대에 손을 댔다.
뜨겁다.
뜨거운 것이 안에서 맥동하고 있는 듯 했다. 뜨겁고 딱딱한 표면은 육질의 부드러운 가죽으로 둘러 쌓여있었다. 현낭은 알 수 없었지만 남근의 그것과 완전히 똑같은 감촉이었다. 그만큼 금고봉은 용도에 따라 자유자재의 변화가 가능했다.
게다가 취란이 흘린 액체에 의해 번들번들 했지만 이상하게도 더럽게 느껴지지 않았다.
“하아아앙, 거,거기, 좋아, 좀더…”
금고봉이 자신의 의지를 떠나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하자 취란은 봉에서 손을 땠다.
현낭은 봉에서 손을 땔 수 없게 되자 당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어색한 손놀림으로 계속해서 휘적휘적 회전시켰다.
“아, 하아, 흑, 좋아! 좋아앗!”
취란은 빈손이 된 오른손으로 음핵을 쓰다듬으며 더욱 소리를 높였다. 음핵과 밀호에 동시에 솟아지는 음란한 자극에 취란은 또 절정을 향해 내달렸다.
‘대,대단해…’
현낭은 몇 번이나 침을 삼키고 있었다. 그 압도적인 색욕에 달려들자 현낭의 호흡도 거칠어지며 가슴이 두근거리며 답답해져 왔다.
“하앙…”
현낭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흘러 나왔다. 팔을 구부릴 때 팔꿈치 안쪽이 유두를 스치고 지난 것이었다. 그 모습은 어딘가 부자연스러워 보이기는 했지만 고의적인 것은 아니었다. 다만, 현낭의 안에서 생겨난 분홍색의 무의식이 현낭의 몸을 조종하는 것이었다.
한편 취란은 고깃덩이의 화분에서 발정난 암캐가 되어 몸을 들썩이며 흔들고 있었다. 취란이 엉덩이가 상하로 움직이자 뜻하지 않게 밀호를 찌걱 이며 찔러 넣었다 뺐다가하는 동작이 되었다. 현낭은 새빨개진 얼굴로 그 작업에 열중하고 있었다.
“아앙, 아앗, 이제, 이젠, 학, 학, 주, 죽을 것 같아아앙!”
취란의 눈이 뒤집어 지며 경련하였다.
그 광장한 절정을 보면서도 현낭은 손을 멈추지 않았다. 시선은 윤활유를 뿜어내고 있는 접합부를 보고 있었다. 음정에 부푼 벽은 오공의 봉이 들락날락하는 움직임에 맞추어 얼굴을 보였다가 숨거나하였다.
어느 사이 현낭은 허벅지를 붙이고 옷 안에서 무릎을 비비고 있었다. 감질 나는 미약한 전류가 단속적으로 허리를 통해 척추를 타고 올라 점점 더 서있기가 힘들어 졌다. 엉거주춤한 자세에서 현낭은 무릎을 땅위에 떨어뜨리며 발가락을 세워 정좌를 하였다.
그렇게 하면 비적비적 무릎을 비빌 때 마다 고간의 중심에서 뭔가 짜릿하고 날카로운 쾌감 같은 것이 생겼다. 현낭은 숨이 거칠어지며 입이 반쯤 열려 닫힐 줄 몰랐다.
“하아, 하아”
“좋아, 하아아악! 좀더, 좀더, 온다, 학, 죽을 것 같앗!”
부들부들 취란의 몸이 경련했다. 오공의 금고봉이 음렬을 휘저으며 취란을 부수어 갔다. 그 부수어지는 느낌이 현낭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져 오는 것 같았다.
현낭은 그것에 너무 열중한 나머지 사람들이 다가오는 소리가 꽤 가까워 질 때야 알게 되었다. 깜짝 놀라 손을 때고 취란에게서 멀어졌다.
“하악, 흑, 하아앗!”
버팀목을 잃은 금고봉이 취란의 안쪽으로 찔러 들어가며 쓰러졌다. 그 진동으로 취란은 절정을 맞이했다.
고노인은 중년이상의 여자 하녀들만 데리고 온 것 같았다. 취란에 대한 배려와 젊은 여자들의 자극에 대해 생각하면 당연한 것이었다.
그녀들이 수풀을 넘으며 본 것은 곡예를 하듯이 기묘하게 몸을 접은 취란과 취란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고친 숨을 토하며 얼굴이 새빨갛게 변한 비구니 현낭의 모습이었다.
미고니 현낭(美苦尼 玄娘) ~치옥의 서유기 32편
꿀꺽, 현낭은 침을 삼켰다.
피부 밑으로 흐르는 신경이 묘한 간지러움에 자극 받고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피부가 평상시와는 다르게 솟아오르는 듯한 느낌에 기분이 좋았다.
오공의 금고봉이 끈적이는 액체의 실을 늘어뜨리며 격렬하게 들락날락 거렸다.
‘저것이, 오공씨의 금고봉…’
현낭은 열정적인 시선으로 그것을 응시했다. 언제나 보아온 것이었지만 지금은 몹시 추해 보였다. 아니, 그렇기보다는 오히려 사랑스럽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현낭은 그런 생각을 오공의 소지품이기 때문이라고 애써 생각했다. 그러고 보니 현낭은 아직 금고봉을 만져본 적도 없었다.
오공에게 금고봉이라는 것은 매우 무거워 아무리 강한 요괴라고 하여도 들 수조차 없다고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취란은 들어올리기도 힘들다는 금고봉을 가지고 이런 불쾌한 일에 사용할 수 있는 걸까? 여자의 약한 힘으로도 들 수 있도록 변하는 것도 가능한 것일까?
자신은 아직 손조차 대보지 못했는데, 취란은 추잡한 행위에 오공의 금고봉을 사용하고 있다.
현낭은 순간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흐으으으응, 아, 하앙, 오,온다아아앗!”
취란이 한층 더 큰소리로 외치며 절정에 달했다. 온몸을 비틀며 격렬한 쾌감을 참고 있었다. 하지만, 또다시 새로운 쾌감을 얻기 위해 흐트러진 양다리를 더욱 높게 들어 올렸다.
엉덩이 쪽의 구멍이 하늘을 향하도록 몸을 구부리고 왼손으로는 금고봉의 끝을 이끌어 다리와 수직이 되게 세웠다.
“하악”
끓어오를 것같이 가열된 밀호가 금고봉의 요철에 도려내어지며 취란으로 하여금 비명을 지르게 했다.
앞구르기를 하려다 중간에 멈춘 것 같은 모습에서 다리는 V자 형태로 벌어져 있었고, 발가락은 땅에 닫고 있었다. 머리는 아래, 엉덩이는 위에 있는 모습으로 금고봉을 수직으로 꽂은 모습은 현낭이 보기에는 마치 고깃덩이로 만들어진 화분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아앙… 이거… 대단해…”
취란은 계속 자극하기 위해서 자신의 속에서부터 우뚝 솟은 금고봉을 휘적휘적 돌렸다.
취란의 자궁 안이 휘저어지고 있는 모습이 상상되어 현낭은 꿀꺽 침을 삼켰다.
취란의 몸은 매우 부드러웠다.
취란은 오른쪽 다리를 머리 쪽으로 가져가더니 목 뒤로 걸쳤다. 돼지 요괴에게 온갖 변태적인 행위를 강요당하는 사이 이렇게까지 부드러워진 것이었다.
취란은 금고봉을 고정하고 있던 손을 오른손으로 바꾸더니 왼손을 사용하여 왼쪽 다리도 목뒤로 걸쳤다. 이렇게 취란은 고간에서 항문까지 고스란히 드러나는 부끄러운 자세로 스스로 구속을 하더니 왼손을 엉덩이 구멍으로 가져갔다.
“힉”
작은 비명을 지르며 손으로 입을 가린 것은 현낭 쪽이었다.
‘무,무슨 짓을…’
취란의 가늘고 흰 손가락이 집요한 손놀림으로 항문의 구덩이를 어루만지고 있었다.
그런 짓이 기분 좋다니…라고 생각하면서도 현낭은 눈을 떼지 못하고 보고 있노라니 자신의 엉덩이 구멍까지 근질근질해져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휘적휘적 금고봉이 휘저어 질 때마다 넘쳐 나오는 액체가 엉덩이의 구덩이에도 쌓여갔다. 그 미끄러움을 이용하여 취란은 손가락 끝을 조금씩 넣어갔다.
“학, 학, 하아, 아…”
취란은 손가락을 작게 왕복운동 시키며 발정 난 암캐 같은 신음을 흘렸다.
현낭은 취란의 손가락이 움직일 때마다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다. 엉덩이 구멍에 축축하고 가느다란 것이 침입해 오는 듯한 느낌이 들어 자신도 모르게 항문에 힘이 들어갔다.
얼굴을 들면 눈앞에 오공의 금고봉이 휘적휘적 원을 그리며 취란의 밀호를 범하고 있었다.
사실 현낭은 전부터 이 금고봉을 한 번 만져보고 싶었었다. 어떻게 이런 찬스가 다시 올까? 여기서 만져보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 할 것 같았다.
‘게다가 빠지지 않게 제대로 고정만 한다면 오공씨가 말한 것을 돕게 되는 거야.’
현낭은 기묘한 정당화를 생각해 내며 떨리는 손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조심조심 손을 뻗어 갔다.
현낭은 금고봉의 회전을 따라가며 그 장대에 손을 댔다.
뜨겁다.
뜨거운 것이 안에서 맥동하고 있는 듯 했다. 뜨겁고 딱딱한 표면은 육질의 부드러운 가죽으로 둘러 쌓여있었다. 현낭은 알 수 없었지만 남근의 그것과 완전히 똑같은 감촉이었다. 그만큼 금고봉은 용도에 따라 자유자재의 변화가 가능했다.
게다가 취란이 흘린 액체에 의해 번들번들 했지만 이상하게도 더럽게 느껴지지 않았다.
“하아아앙, 거,거기, 좋아, 좀더…”
금고봉이 자신의 의지를 떠나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하자 취란은 봉에서 손을 땠다.
현낭은 봉에서 손을 땔 수 없게 되자 당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어색한 손놀림으로 계속해서 휘적휘적 회전시켰다.
“아, 하아, 흑, 좋아! 좋아앗!”
취란은 빈손이 된 오른손으로 음핵을 쓰다듬으며 더욱 소리를 높였다. 음핵과 밀호에 동시에 솟아지는 음란한 자극에 취란은 또 절정을 향해 내달렸다.
‘대,대단해…’
현낭은 몇 번이나 침을 삼키고 있었다. 그 압도적인 색욕에 달려들자 현낭의 호흡도 거칠어지며 가슴이 두근거리며 답답해져 왔다.
“하앙…”
현낭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흘러 나왔다. 팔을 구부릴 때 팔꿈치 안쪽이 유두를 스치고 지난 것이었다. 그 모습은 어딘가 부자연스러워 보이기는 했지만 고의적인 것은 아니었다. 다만, 현낭의 안에서 생겨난 분홍색의 무의식이 현낭의 몸을 조종하는 것이었다.
한편 취란은 고깃덩이의 화분에서 발정난 암캐가 되어 몸을 들썩이며 흔들고 있었다. 취란이 엉덩이가 상하로 움직이자 뜻하지 않게 밀호를 찌걱 이며 찔러 넣었다 뺐다가하는 동작이 되었다. 현낭은 새빨개진 얼굴로 그 작업에 열중하고 있었다.
“아앙, 아앗, 이제, 이젠, 학, 학, 주, 죽을 것 같아아앙!”
취란의 눈이 뒤집어 지며 경련하였다.
그 광장한 절정을 보면서도 현낭은 손을 멈추지 않았다. 시선은 윤활유를 뿜어내고 있는 접합부를 보고 있었다. 음정에 부푼 벽은 오공의 봉이 들락날락하는 움직임에 맞추어 얼굴을 보였다가 숨거나하였다.
어느 사이 현낭은 허벅지를 붙이고 옷 안에서 무릎을 비비고 있었다. 감질 나는 미약한 전류가 단속적으로 허리를 통해 척추를 타고 올라 점점 더 서있기가 힘들어 졌다. 엉거주춤한 자세에서 현낭은 무릎을 땅위에 떨어뜨리며 발가락을 세워 정좌를 하였다.
그렇게 하면 비적비적 무릎을 비빌 때 마다 고간의 중심에서 뭔가 짜릿하고 날카로운 쾌감 같은 것이 생겼다. 현낭은 숨이 거칠어지며 입이 반쯤 열려 닫힐 줄 몰랐다.
“하아, 하아”
“좋아, 하아아악! 좀더, 좀더, 온다, 학, 죽을 것 같앗!”
부들부들 취란의 몸이 경련했다. 오공의 금고봉이 음렬을 휘저으며 취란을 부수어 갔다. 그 부수어지는 느낌이 현낭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져 오는 것 같았다.
현낭은 그것에 너무 열중한 나머지 사람들이 다가오는 소리가 꽤 가까워 질 때야 알게 되었다. 깜짝 놀라 손을 때고 취란에게서 멀어졌다.
“하악, 흑, 하아앗!”
버팀목을 잃은 금고봉이 취란의 안쪽으로 찔러 들어가며 쓰러졌다. 그 진동으로 취란은 절정을 맞이했다.
고노인은 중년이상의 여자 하녀들만 데리고 온 것 같았다. 취란에 대한 배려와 젊은 여자들의 자극에 대해 생각하면 당연한 것이었다.
그녀들이 수풀을 넘으며 본 것은 곡예를 하듯이 기묘하게 몸을 접은 취란과 취란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고친 숨을 토하며 얼굴이 새빨갛게 변한 비구니 현낭의 모습이었다.

최고관리자
| 가입일 | 2016-08-11 | 접속일 | 2024-11-23 |
|---|---|---|---|
| 가입일 | 2016-08-11 | ||
| 접속일 | 2024-11-23 | ||
| 서명 | 황진이-19금 성인놀이터 | ||
| 태그 | |||
| 황진이-무료한국야동,일본야동,중국야동,성인야설,토렌트,성인야사,애니야동
야동토렌트, 국산야동토렌트, 성인토렌트, 한국야동, 중국야동토렌트, 19금토렌트 |
|||
추천 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