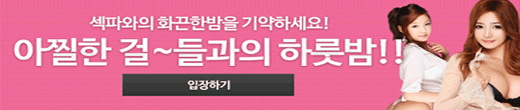연희의 숨소리가 심상치 않다. 무슨 일이라도 있었던 것 마냥 연희의 얼굴은 홍조를 띠고 있었고 테이블 밑에서 기어 나오는 동규는 그 모습에 당황해한다.
“무... 무슨 일이야?”
“나... 나 머리가 너무 어지러워... 그리고... 하아... 하아...”
“연희야!”
“숨 쉬기 힘들어, 왜 이렇게 뜨겁지? 너무 뜨거워...”
“응?”
다급한 상황인 것 같았다. 동규는 그런 연희를 쳐다보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라하는 모습이었고 연희는 연신 거친 숨을 몰아쉰다. 자신의 앞에 티슈를 한 장 꺼내 물에 적신 뒤 연희에게 건네며 묻는다.
“이... 이거...”
“헉헉... 그... 그게 뭐야?”
“이마에 땀이 많이 흐르고 있어. 좀 닦아 봐.”
“헉헉...”
자신에게 물을 적신 티슈를 건네는 동규의 모습을 본 연희의 시선은 초점을 잃어 갔고 점점 자신에게 다가오는 동규의 넥타이를 잡는 연희.
“욱! 연... 연희야!”
“사랑... 사랑해줘...”
“쭙...”
“!”
갑작스런 연희의 달콤한 입맞춤에 동규의 정신도 아찔해져만 간다. 연희의 키스를 거부하던 동규는 그런 연희를 밀쳐 내려했지만 워낙 완강한 그녀의 억지에 조심스럽게 두 눈을 감고야 만다.
“......”
“사... 사랑해줘. 날...”
“연희야...”
그대로 소파 뒤로 넘어진 연희를 내려다보던 동규도 이 상을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었고 동규의 시선은 연희의 얼굴에서 조금씩 아래로 향한다. 풍만한 가슴, 그녀의 배꼽... 그리고...
“하악...!”
“정...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거지?”
“으응... 날... 날 탐해 줘... 허억...”
동규의 한 손은 연희의 둔덕 부위에 올려 졌고 천천히 쓰다듬듯 손바닥을 문지른다. 그 자극에 연희는 연신 허리를 튕기며 쾌락의 나락에 빠져 들어갔다.
“응큼한 녀석...”
“모르겠어, 네가 테이블 밑에서 자꾸 내 그곳을 쳐다본다 생각하니... 견딜 수 없게 되었다고.”
“알고 있었구나?”
“으응... 보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테이블 밑에서 너의 숨소리만 들어도 느낄 수 있었는 걸.”
“하악... 연희야...”
“헉헉...”
연희 몸 위를 덮친 동규의 동작은 신속했고 능숙했다. 긴 다리를 자신의 두 양팔에 끼운 뒤 다리를 벌리게 하고 이미 텐트를 친 자신의 중심부를 연희의 팬티 위에 문지르자 연희의 두 눈은 토끼눈이 되어 버렸다.
“헉... 설... 설마... 너...”
“몰라... 네가 날 이렇게 만들었어!”
“바지를 입고 있어서 그런 거지? 그렇지? 그렇지 않다면...”
“왜?”
“너... 네 물건... 너무... 너무 크게 느껴져.”
“......”
동규는 연희의 말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바지 지퍼를 내리고 팬티 뒤에 숨은 자신의 무기를 꺼내는데.
“어머나... 그게 대체 뭐야?!”
“왜? 이걸 바란 게 아니었어?”
“하... 하지만... 세상에... 이런 크기의 물건이 있을 줄이야...”
“내 키가 작아 이것도 작을 줄 알았나 보지?”
“말... 말도 안 돼.”
엄청난 두께와 길이를 자랑하는 동규의 물건에 연희는 놀라운 감탄사를 연발하기 시작했고 다리를 벌리고 하얀 팬티를 내 놓은 연희는 시선을 강탈 받은 것처럼 부동자세를 유지하기만 했다.
“연희야, 미안한데... 나도 이렇게 된 거 바로 삽입하고 싶어.”
“아, 그... 그래... 하지만 네 물건이... 너무 커.”
“그래도... 연희야... 난... 흐윽...”
“아아아... 허억...!!”
무지막지한 동규의 물건을 자신의 다리 사이로 받아 내고 있는 연희는 오만인상을 찡그리며 고통스러워하기 시작했고 자신의 귀두부분 조차 삽입이 되지 않음을 느낀 동규의 허리에 더 강한 힘이 집중되어 졌다. 연희는 동규의 물건을 받아들이며 찢어지는 고통이 뭔지 제대로 느끼기 시작한다.
“아아아... 동... 동규야... 무... 무리야...”
“이익... 왜 이렇게 안 들어가지?”
“너... 네 것이 정말... 정말 크다고!”
“안 돼, 여기서 이렇게 멈출 수는 없단 말이야. 조금만... 조금만... 더...”
“미치겠어, 더는... 더는... 안 된다고!”
“이얏!”
“!”
연희의 울음 섞인 부탁을 나몰라라 하던 동규가 마지막이란 생각으로 강하게 허리를 움직여 연희의 작은 동굴로 자신의 물건을 찔러 넣는다. 다행히 동규의 귀두부분이 살짝 삽입이 되었고 연희는 그 느낌에 충격적인 고통을 맛보고 있었다. 연희는 두려움까지 느낄 만한 동규의 물건 크기에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다.
“윽... 아... 살짝 들어갔어, 이제 조금만... 조금만 더하면...”
“아악! 악! 안 돼, 어서.. 빼.... 살려... 살려줘!”
“이익...”
“헉...!”
그런말 조차 동규에서 들리지 않는다. 살려달라는 말 조차 동규에게는 그냥 지나치는 소리에 불과했다.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어떤 남자라도 자기 밑에서 헐떡이고 있는 여자를 그냥 놔줄리 없지 않은가. 동규에게 그 상황은 본능에 충실해야만 하는 순간이기도 했다.
“조금만 참아! 으윽...”
“헉헉... 동규야... 나 정말 이러다... 찢어져 버려!”
“윽윽... 됐... 됐어!”
“악!!”
엄청난 노력으로 이룬 성과였다. 큼지막한 동규의 물건은 울부짖는 연희의 부탁을 외면한 채 가장 깊숙한 곳으로 향했고 말뚝이라는 표현이 무색하지 않을 만큼 어마어마한 크기의 성기를 받아낸 연희는 기절하기 일보직전이었다.
“컥... 컥...”
“뜨... 뜨거워, 연희의 몸 속... 내가 정말 원하고 원했던 곳이야.”
“동... 동규야.... 너 정말... 컥컥...”
“찰싹, 찰싹!”
자신의 성기를 감싸고 있는 연희의 질은 동규에게 인간이기보다 동물에 가까운 성향을 돌출시켰다. 동규에게는 절정의 순간을, 연희에게는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순간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었다. 연희의 두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고 고개를 들어 자신의 다리 사이로 박혀 있는 말뚝을 보며 흥분보다 두려움, 고통을 느끼게 하고 있었다.
“헉헉... 너무 좋아, 연희야... 널 사랑해.”
“컥컥... 컥...”
“하아... 하아...”
“찰싹, 찰싹!”
연희는 동규가 미워지기 시작했다. 이건 자신을 죽이기 위한 행위라 단정 지을 수밖에 없었고 자신의 부탁을 무시하는 동규가 정말 미웠다. 하지만, 박음질의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연희의 동굴은 부드러워지기 시작했고 어마어마한 크기에 맞춰 질구의 쪼임이 달라지기 시작한다.
“흐... 흐응...”
“연희도 느끼고 있는 거야?”
“모... 모르겠어, 이게 좋은 느낌인지...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그게 뭔데?”
“하아... 나... 처음처럼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는 사실이야... 우워워...”
“난... 처음부터... 뜨거웠다고...”
“하악... 이제... 알겠어... 이 느낌... 그래, 이거야!”
연희는 동규의 머리를 두 팔로 감싸며 안았고 자신의 아랫부분을 동규에게 최대한 밀착을 하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다. 자신의 음핵을 최대한 동규에게 밀착하고 싶었고 그럼으로써 자신이 기분이 좋아짐을 알고 있었다. 동규의 기둥 가까이 밀착한 음핵을 허리의 힘을 이용해 비비기 시작하자 통증은 서서히 사라지게 되었다.
“하악... 하악... 좋... 좋아... 동규야, 정말... 정말 너 대단해!”
“연희 구멍이 너무 꽉 쪼여와... 으윽...”
“하아... 하아... 나 태어나 남자와 이런 기분 느끼는 건 처음이야... 하아... 하아...”
“윽...”
“더 빨리... 더 빨리 움직여! 어서...!”
생전 여자와 섹스를 할 때 재촉을 받으며 섹스를 한 경험이 없었다. 그런 경험이 동규에게는 매우 흥미스러웠고 흥분하게 만들었던 모양이다. 그렇지 않아도 거대한 물건이 더욱 굵어지고 길어지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너... 너무... 너무 딱딱 해! 미쳐버리겠어!”
“아아아... 이게 다 너때문이야!”
“동규야... 하악... 싸면 안 돼! 더 오래 박아 줘!”
“무... 무리야...!”
동규는 정상 체위를 하던 중 연희를 번쩍 들어 안았다. 공중에 매미처럼 매달려 있는 연희가 뿌리 끝까지 자신에게 박힌 동규의 물건을 감당하기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
“커허헉... 나... 정말 찢어져 버려!”
“그래, 걸래로 만들어 주지!”
“아아아... 아파!! 흐억...!”
“퍽퍽퍽...!”
미끈미끈한 연희의 구멍으로 거대한 동규의 몽둥이가 방아질을 했고 자신의 신음 소리가 룸 밖으로 세어나가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에 손으로 입을 막은 채 신음을 이겨내는 연희의 모습은 대단한 볼거리였다.
“흐읍... 흐읍... 살... 살려줘... 하악...”
“퍽퍽퍽!”
“아악... 동규야... 제발... 아악!”
“이제 조금만 더 하면... 이제 조금만...”
“흐으음...!”
동규에게 절정이 다다른 것이었다. 연희에게 엄청난 사정을 하기 위해 준비하는 동규를 연희는 공중에 매달린 채 두렵게 바라보기만 하고 있다.
“무... 무슨 일이야?”
“나... 나 머리가 너무 어지러워... 그리고... 하아... 하아...”
“연희야!”
“숨 쉬기 힘들어, 왜 이렇게 뜨겁지? 너무 뜨거워...”
“응?”
다급한 상황인 것 같았다. 동규는 그런 연희를 쳐다보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라하는 모습이었고 연희는 연신 거친 숨을 몰아쉰다. 자신의 앞에 티슈를 한 장 꺼내 물에 적신 뒤 연희에게 건네며 묻는다.
“이... 이거...”
“헉헉... 그... 그게 뭐야?”
“이마에 땀이 많이 흐르고 있어. 좀 닦아 봐.”
“헉헉...”
자신에게 물을 적신 티슈를 건네는 동규의 모습을 본 연희의 시선은 초점을 잃어 갔고 점점 자신에게 다가오는 동규의 넥타이를 잡는 연희.
“욱! 연... 연희야!”
“사랑... 사랑해줘...”
“쭙...”
“!”
갑작스런 연희의 달콤한 입맞춤에 동규의 정신도 아찔해져만 간다. 연희의 키스를 거부하던 동규는 그런 연희를 밀쳐 내려했지만 워낙 완강한 그녀의 억지에 조심스럽게 두 눈을 감고야 만다.
“......”
“사... 사랑해줘. 날...”
“연희야...”
그대로 소파 뒤로 넘어진 연희를 내려다보던 동규도 이 상을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었고 동규의 시선은 연희의 얼굴에서 조금씩 아래로 향한다. 풍만한 가슴, 그녀의 배꼽... 그리고...
“하악...!”
“정...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거지?”
“으응... 날... 날 탐해 줘... 허억...”
동규의 한 손은 연희의 둔덕 부위에 올려 졌고 천천히 쓰다듬듯 손바닥을 문지른다. 그 자극에 연희는 연신 허리를 튕기며 쾌락의 나락에 빠져 들어갔다.
“응큼한 녀석...”
“모르겠어, 네가 테이블 밑에서 자꾸 내 그곳을 쳐다본다 생각하니... 견딜 수 없게 되었다고.”
“알고 있었구나?”
“으응... 보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테이블 밑에서 너의 숨소리만 들어도 느낄 수 있었는 걸.”
“하악... 연희야...”
“헉헉...”
연희 몸 위를 덮친 동규의 동작은 신속했고 능숙했다. 긴 다리를 자신의 두 양팔에 끼운 뒤 다리를 벌리게 하고 이미 텐트를 친 자신의 중심부를 연희의 팬티 위에 문지르자 연희의 두 눈은 토끼눈이 되어 버렸다.
“헉... 설... 설마... 너...”
“몰라... 네가 날 이렇게 만들었어!”
“바지를 입고 있어서 그런 거지? 그렇지? 그렇지 않다면...”
“왜?”
“너... 네 물건... 너무... 너무 크게 느껴져.”
“......”
동규는 연희의 말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바지 지퍼를 내리고 팬티 뒤에 숨은 자신의 무기를 꺼내는데.
“어머나... 그게 대체 뭐야?!”
“왜? 이걸 바란 게 아니었어?”
“하... 하지만... 세상에... 이런 크기의 물건이 있을 줄이야...”
“내 키가 작아 이것도 작을 줄 알았나 보지?”
“말... 말도 안 돼.”
엄청난 두께와 길이를 자랑하는 동규의 물건에 연희는 놀라운 감탄사를 연발하기 시작했고 다리를 벌리고 하얀 팬티를 내 놓은 연희는 시선을 강탈 받은 것처럼 부동자세를 유지하기만 했다.
“연희야, 미안한데... 나도 이렇게 된 거 바로 삽입하고 싶어.”
“아, 그... 그래... 하지만 네 물건이... 너무 커.”
“그래도... 연희야... 난... 흐윽...”
“아아아... 허억...!!”
무지막지한 동규의 물건을 자신의 다리 사이로 받아 내고 있는 연희는 오만인상을 찡그리며 고통스러워하기 시작했고 자신의 귀두부분 조차 삽입이 되지 않음을 느낀 동규의 허리에 더 강한 힘이 집중되어 졌다. 연희는 동규의 물건을 받아들이며 찢어지는 고통이 뭔지 제대로 느끼기 시작한다.
“아아아... 동... 동규야... 무... 무리야...”
“이익... 왜 이렇게 안 들어가지?”
“너... 네 것이 정말... 정말 크다고!”
“안 돼, 여기서 이렇게 멈출 수는 없단 말이야. 조금만... 조금만... 더...”
“미치겠어, 더는... 더는... 안 된다고!”
“이얏!”
“!”
연희의 울음 섞인 부탁을 나몰라라 하던 동규가 마지막이란 생각으로 강하게 허리를 움직여 연희의 작은 동굴로 자신의 물건을 찔러 넣는다. 다행히 동규의 귀두부분이 살짝 삽입이 되었고 연희는 그 느낌에 충격적인 고통을 맛보고 있었다. 연희는 두려움까지 느낄 만한 동규의 물건 크기에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다.
“윽... 아... 살짝 들어갔어, 이제 조금만... 조금만 더하면...”
“아악! 악! 안 돼, 어서.. 빼.... 살려... 살려줘!”
“이익...”
“헉...!”
그런말 조차 동규에서 들리지 않는다. 살려달라는 말 조차 동규에게는 그냥 지나치는 소리에 불과했다.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어떤 남자라도 자기 밑에서 헐떡이고 있는 여자를 그냥 놔줄리 없지 않은가. 동규에게 그 상황은 본능에 충실해야만 하는 순간이기도 했다.
“조금만 참아! 으윽...”
“헉헉... 동규야... 나 정말 이러다... 찢어져 버려!”
“윽윽... 됐... 됐어!”
“악!!”
엄청난 노력으로 이룬 성과였다. 큼지막한 동규의 물건은 울부짖는 연희의 부탁을 외면한 채 가장 깊숙한 곳으로 향했고 말뚝이라는 표현이 무색하지 않을 만큼 어마어마한 크기의 성기를 받아낸 연희는 기절하기 일보직전이었다.
“컥... 컥...”
“뜨... 뜨거워, 연희의 몸 속... 내가 정말 원하고 원했던 곳이야.”
“동... 동규야.... 너 정말... 컥컥...”
“찰싹, 찰싹!”
자신의 성기를 감싸고 있는 연희의 질은 동규에게 인간이기보다 동물에 가까운 성향을 돌출시켰다. 동규에게는 절정의 순간을, 연희에게는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순간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었다. 연희의 두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고 고개를 들어 자신의 다리 사이로 박혀 있는 말뚝을 보며 흥분보다 두려움, 고통을 느끼게 하고 있었다.
“헉헉... 너무 좋아, 연희야... 널 사랑해.”
“컥컥... 컥...”
“하아... 하아...”
“찰싹, 찰싹!”
연희는 동규가 미워지기 시작했다. 이건 자신을 죽이기 위한 행위라 단정 지을 수밖에 없었고 자신의 부탁을 무시하는 동규가 정말 미웠다. 하지만, 박음질의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연희의 동굴은 부드러워지기 시작했고 어마어마한 크기에 맞춰 질구의 쪼임이 달라지기 시작한다.
“흐... 흐응...”
“연희도 느끼고 있는 거야?”
“모... 모르겠어, 이게 좋은 느낌인지...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그게 뭔데?”
“하아... 나... 처음처럼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는 사실이야... 우워워...”
“난... 처음부터... 뜨거웠다고...”
“하악... 이제... 알겠어... 이 느낌... 그래, 이거야!”
연희는 동규의 머리를 두 팔로 감싸며 안았고 자신의 아랫부분을 동규에게 최대한 밀착을 하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다. 자신의 음핵을 최대한 동규에게 밀착하고 싶었고 그럼으로써 자신이 기분이 좋아짐을 알고 있었다. 동규의 기둥 가까이 밀착한 음핵을 허리의 힘을 이용해 비비기 시작하자 통증은 서서히 사라지게 되었다.
“하악... 하악... 좋... 좋아... 동규야, 정말... 정말 너 대단해!”
“연희 구멍이 너무 꽉 쪼여와... 으윽...”
“하아... 하아... 나 태어나 남자와 이런 기분 느끼는 건 처음이야... 하아... 하아...”
“윽...”
“더 빨리... 더 빨리 움직여! 어서...!”
생전 여자와 섹스를 할 때 재촉을 받으며 섹스를 한 경험이 없었다. 그런 경험이 동규에게는 매우 흥미스러웠고 흥분하게 만들었던 모양이다. 그렇지 않아도 거대한 물건이 더욱 굵어지고 길어지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너... 너무... 너무 딱딱 해! 미쳐버리겠어!”
“아아아... 이게 다 너때문이야!”
“동규야... 하악... 싸면 안 돼! 더 오래 박아 줘!”
“무... 무리야...!”
동규는 정상 체위를 하던 중 연희를 번쩍 들어 안았다. 공중에 매미처럼 매달려 있는 연희가 뿌리 끝까지 자신에게 박힌 동규의 물건을 감당하기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
“커허헉... 나... 정말 찢어져 버려!”
“그래, 걸래로 만들어 주지!”
“아아아... 아파!! 흐억...!”
“퍽퍽퍽...!”
미끈미끈한 연희의 구멍으로 거대한 동규의 몽둥이가 방아질을 했고 자신의 신음 소리가 룸 밖으로 세어나가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에 손으로 입을 막은 채 신음을 이겨내는 연희의 모습은 대단한 볼거리였다.
“흐읍... 흐읍... 살... 살려줘... 하악...”
“퍽퍽퍽!”
“아악... 동규야... 제발... 아악!”
“이제 조금만 더 하면... 이제 조금만...”
“흐으음...!”
동규에게 절정이 다다른 것이었다. 연희에게 엄청난 사정을 하기 위해 준비하는 동규를 연희는 공중에 매달린 채 두렵게 바라보기만 하고 있다.

최고관리자
| 가입일 | 2016-08-11 | 접속일 | 2024-11-23 |
|---|---|---|---|
| 가입일 | 2016-08-11 | ||
| 접속일 | 2024-11-23 | ||
| 서명 | 황진이-19금 성인놀이터 | ||
| 태그 | |||
| 황진이-무료한국야동,일본야동,중국야동,성인야설,토렌트,성인야사,애니야동
야동토렌트, 국산야동토렌트, 성인토렌트, 한국야동, 중국야동토렌트, 19금토렌트 |
|||
추천 0 비추천 0